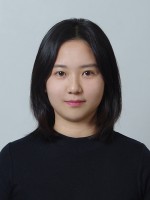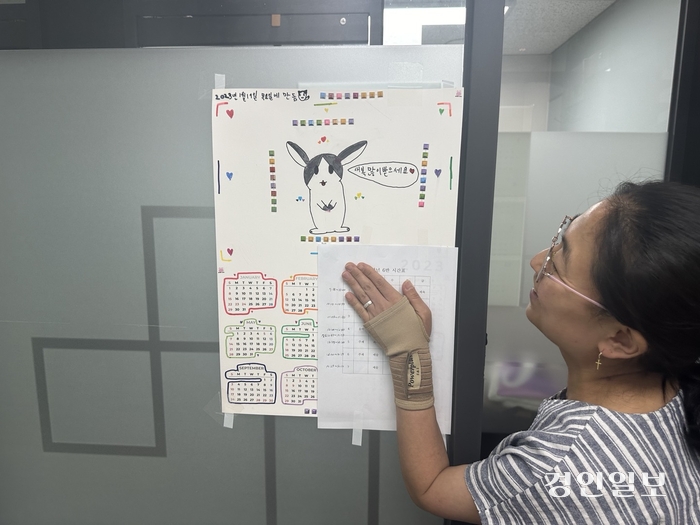
수원에서 13살 딸을 홀로 키우는 정수진(43)씨는 아이를 낳은 뒤 부모와의 연을 끊었다고 했다. 사촌 모두의 이름이 새겨진 할아버지 묘비에 유일하게 수진씨 딸아이 이름만 표기되지 않았다. ‘집안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정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는 “미혼모가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할 때 가장 발목을 잡는 건 편견”이라며 “단순히 지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넘어 가족과 직장 관계의 단절로까지 이어져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미혼모들 사이에선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 발굴이라는 정책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임신부가 의료기관에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임신부가 본인의 이름이 아닌 관리번호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이의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다.
하지만 미혼모들은 보호출산제 시행이 한부모가정을 향한 편견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혼모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정식 절차를 통해 입양을 보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아이를 ‘버리는’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결국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를 발굴한다는 보호출산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선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영아를 유기한 엄마들을 만나보면 정작 가족들도 임신 사실을 몰랐거나 임신부를 지원하는 병원비 바우처 카드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늘려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호출산제는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줌으로써 정작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위기상황에 놓인 임신부가 홀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만나 상담하고 설득하려는 게 정책의 1차적인 목표”라며 “현재로선 주거, 양육비, 취업, 자립훈련 등 한부모가정 지원제도가 임산부를 설득할 수준이 안 되는 상황이 문제다. 결국 한부모 지원정책이 토대를 이뤄야 아이와 임산부 모두를 지원한다는 정책의 실효성도 생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