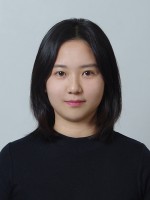국가인권위원회가 남학생에게 앞쪽 출석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이 성차별이라고 지적한 지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450여개 학교에서 성별을 기준 삼아 번호를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454곳에서 남학생에게 앞번호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출석번호를 지정하고 있다. 예컨대 한 학급의 학생이 50명이고 남녀학생이 각각 25명씩 있는 경우 남학생에게 1~25번까지, 여학생에게 26~50번까지 번호를 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성차별적 관행’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하고 ‘남녀 간 선후가 있다는 차별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 2018년에도 성별을 기준삼는 방식이 ‘성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차 고지했지만,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의 재권고 이후인 2019년부터 설립된 학교 중에서도 23개교가 이러한 방식을 차용했다.
이에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줄을 세우거나 모둠을 꾸리는 등 학생들을 구분해야 할 때 성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잦은데, 이런 방식이 아이들의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안성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씨는 “학생들이 급식을 기다리는 줄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눠 세우는데, 그 이유로 남학생은 밥을 빨리 먹은 뒤 축구를 하러 가고 여학생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천천히 먹는다는 등 정형화된 이미지가 꼽혔다”며 “학생들을 성별로 나눌수록 아이들이 성별을 떠나 유연하게 사고할 기회가 가로막힌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기반으로 학교에 성별 구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출석부를 바꾸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며 시정해오고 있다”며 “경기도가 워낙 넓고 학교 내에서도 협의가 필요하다 보니 변화가 더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