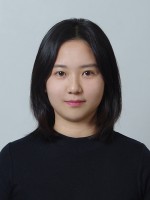비닐하우스 살던 외노자 위험천만
농장주들 불법 발각에 위치 꺼려
경기도, 실제 피해현황 파악 못해

경기도에 집중된 폭설로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 중엔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었다. 포천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한파로 목숨을 잃은지 4년이 지났지만, 추위를 넘어 붕괴 위험까지 떠안고 사는 이들의 주거환경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틀간의 폭설이 훑고 간 지난달 29일 오후 2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8년 된 2층 구옥이 무너져 내렸다. 산산조각난 2층 창문 밖으로 나온 티셔츠와 옷걸이가 사람이 살았다는 걸 추정하게 할 뿐이었다. 이 곳 2층에는 중국인 모자만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달 전까지 1층에도 사람이 살았지만, 집이 기우는 느낌이 들어 보증금도 받지 않고 이사를 강행했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인근 주민 강모(75)씨는 “1층 집 내부 대들보가 휘어져 있었고, 화장실 벽타일도 떨어져 바닥에 깨져 있었다”며 “2층에 사는 중국인 모자에게 몇 번이고 이사를 권했는데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폭설에 속수무책으로 천장이 내려앉은 비닐하우스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다. 안성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함께 살던 캄보디아 국적의 노동자 3명은 인근 농가에서 일하며 농장주가 제공한 비닐하우스에 숙소를 마련했으나, 복구가 되기까진 모텔에 머물러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번 폭설로 인한 실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재민에게 지급한 긴급 생활비를 토대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원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데다, 농장주(세대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불법 가설건축물의 위치가 드러나는 걸 대부분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에서도 캄보디아 국적의 노동자 2명이 비닐하우스 붕괴에 누전까지 겹쳐 쉼터와 지인의 집으로 각각 이사했지만, 용인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소장은 “가장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작 재난 긴급 구제 조치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번 폭설로 추위와 함께 붕괴라는 위험까지 거주지에 도사린다는 걸 확인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대피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3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의 비닐하우스에 살던 외국인 노동자 ‘속헹’이 한파에 숨진 지 4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혹한기 숙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목은수·마주영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