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에 평화로운 일상 산산조각
최고권력자의 어이없는 불장난 분노
45년만 반복된 비극, 희극으로 재현
한강 ‘소년이 온다’ 기시감 어른거려
올겨울, 내 안의 소년도 광장에 설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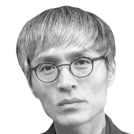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멀어진 지 십 분이 채 되지 않아 군인들의 소리가 들렸다. 그런 소리를 그녀는 처음 들었다. 박자를 맞춘 군홧발 소리, 보도가 갈라지고 벽이 무너질 것 같은 장갑차 소리, 그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여러분, 지금 나와주십시오.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도청 쪽에서 총소리가 들렸을 때…’.(한강 ‘소년이 온다’)
지난 12월3일, 대한민국의 밤은 평화로웠다. 적어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밤 10시40분경, 휴대전화에 비상계엄을 알리는 소식이 수십개 떴다. 믿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처단한다’는 극단적 표현이 두 번이나 들어간 계엄포고령을 읽고, 마침내 군 헬기 프로펠러에 창문이 덜덜 떨리는 소리를 듣고,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TV를 켜고 방송을 통해 국회쪽 소식을 살폈다. 무장한 군인들이 시민과 대치한 장면이 보였고, 총부리가 항의하는 여성을 향하는 아찔한 장면이 지나갔다. 급기야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 두 번째로 읽고 있던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기시감처럼 어른거리는 순간이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마르크스의 ‘프랑스 혁명사’에 나오는 이 유명한 문구는, 비극이 비극인 줄 모르는 바보는 없다는 점에서 희극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후 마르쿠제와 푸코에 의해 재해석되면서 비극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자는 희극으로 재현된 역사의 반복 속에서 비극보다 더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과연 45년만에 재현된 비상계엄은 희극의 모습을 띠고 나타났다. 긴급 소집된 국회는 2시간30분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한 권력자는 새벽 4시경에 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비극을 경험한 이들은 다시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설령 공동체 전체의 개개인이 비극을 야기한 과오를 철저하게 성찰하고 반성한다 하더라도 비극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조건을 만들지 못하면 희극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비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는 지난 세기에 일어난 비극인 4·3과 5·18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 금세기의 비극인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는 희극의 탈을 쓴 비극과 재차 마주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희극의 탈을 쓰고 뻔뻔스럽게 활보하는 비극의 정체는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최고 권력자의 대국민담화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겨우 2분간의 담화에서 그는 당당하게, 때로는 웃음기마저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장난을 치다 들킨 어린아이의 변명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다. 많이 놀랐을 거라고? 국민은 놀란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어처구니없는 불장난에 분노했다. 고작 놀란 데서 멈추기를 바라는 그 가벼움이라니!
지난 토요일 탄핵 의결이 있던 날, 깔개와 핫팩을 챙긴 다음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이용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집회장소로 갈 생각이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환승역에 승객이 너무 많이 몰려 지하철 탑승 자체가 불가능했다. 버스를 이용하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대기 줄이 너무 길어 끝이 보이지 않았다. 눈앞에는 수십 대의 자전거가 여의도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제야 자전거를 대여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떤 이는 지하철로, 어떤 이는 버스로, 또 어떤 이는 자전거와 도보로 움직이고 있었다. 놀라운 건 그들 대부분이 젊은 층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속으로 눈물을 흘렸다. 소년들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올 겨울, 내 안의 소년도 그들과 함께 광장에 설 것이다.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