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발자취, 회원 31명 목소리 담아
‘비인간적 반자연적인 것’ 저항 의지
창립 목적 재확인… 변화점 모색도

■ 구술로 함께하는 인천민예총 30년┃인천민예총30년기획단 엮음. 다인아트 펴냄. 377쪽.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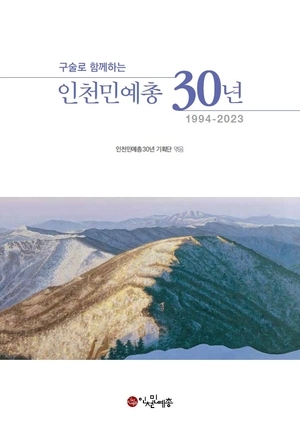
인천의 진보적 문화운동을 이끈 사단법인 인천민예총의 30년을 회원 31명의 구술로 풀어낸 책이다.
인천민예총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인천에서 성장한 진보적 문화운동의 성과와 흐름을 계승해 1994년 9월23일 창립했다. 1988년 생겨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지회로 출발했으며, 2013년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독립했다. 인천민예총은 미술, 문학, 전통예술 등을 중심으로 연극, 영상, 음악, 노동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활동했다.
책은 4부로 구성됐다. 1부는 창립 전후에 있었던 일을 다뤘다. 우선 민예총은 어떤 배경에서 설립됐을까. 책에 따르면,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노동운동 부문이 성장하면서 외부에서 지원받던 문화영역을 노동자 스스로 상당 수준으로 자립·재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문화운동에 투신하던 예술가들은 자기의 작업과 창작에 대한 갈망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들은 본격적으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된다.
1994년 5월 발표된 인천민예총 ‘발기 취지문’은 2024년에 읽어 봐도 시사점을 주는 흥미로운 내용이다. 다음은 발기 취지문의 일부다.
“비류백제가 문학산 기슭에 삶의 보금자리를 틀면서 ‘멧골’ 혹은 ‘뭇골’에 사는 이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면면히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인천 토박이의 삶과 문화는 1883년 일제의 강압에 의한 굴욕적인 개항과 6·25 이후 이북 실향민들의 이주, ‘1960년 경인공단이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의 대거 유입’, ‘80년대 서울 비싼 집값에 밀려난 도시영세민들의 유입’과 90년대 대규모 택지 개발로 내 집을 장만하려는 이들의 유입을 통해 외지인들이 상당수 차지하게 된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도시지만 ‘뜨내기’ 도시라 불리고 있다. (중략) 우리는 이를 통하여 시들어져가는 인천문화의 숨결을 다시 되살릴 것이며 서울 의존적인 ‘뜨내기’ 문화, 퇴폐적이고 향략적인 대중문화,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는 외래문화, 즉 비인간적이고 반자연적인 모든 문화를 배격하고 참다운 ‘굴레벗기’를 하고자 한다.”
책 2부는 인천민예총이 창립 정신으로 정립한 인천의 정체성을 문화예술적으로 탐구한 과정과 결과를 ‘황해’라는 주제로 모았다. 황해미술제, 황해음악제, 황해연극제 등인데, 현재는 모두 종료한 사업들이다. 3부는 노동문화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우현학술제, 문화예술아카데미, 풍물, 인천평화축제, 민예총 강화지부, 복합문화공간 ‘해시’ 조성 등 진보적 예술운동으로서의 인천민예총의 활동을 모았다.
4부는 앞으로의 인천민예총을 모색하는 좌담이다. 이종구, 허용철, 신현수, 홍명진, 이영욱 등 31명의 구술자들을 소개하는 약전이 중간중간 등장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엮으니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진보적 문화운동의 흐름이 보인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실패라 할 수 있는 평가도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보다 활동도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민예총의 창립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모색할 여지는 있다는 게 4부 좌담회 참석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윤진현 문학박사가 편집책임을, 인천민예총 김창길 정책위원장이 기획단장을 각각 맡았으며 성창훈(아카이브), 이병국(교열보조)이 편찬에 참여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