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를 닮은 사람들’ 편강렬 의사 편
황해도 출생으로 의성단 등 항일운동
유해 미반환… 제적봉 추모비 등 소개
■ 강화시선 제16호┃인천민예총 강화지회·전교조 강화지회 펴냄. 292쪽.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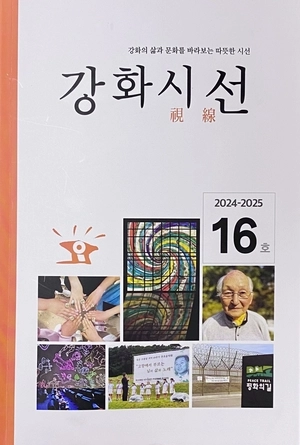
인천 강화군 양사면 접경지 제적봉 위에 있는 ‘강화제적봉평화전망대’(이하 강화평화전망대)는 북한 땅이 내려다보여 실향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다. ‘공산당을 제압하는 봉우리’라는 뜻의 제적봉(制赤峰)과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전망대라는 이름을 함께 쓰는 아이러니함이 있는 장소다.
명절마다 실향민들은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 북녘 고향과 그곳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린다. 다른 한편으로는 쌀이 담긴 페트병과 선전물들이 해류를 타고 북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북에선 소음공격과 오물 풍선이 날아들기도 한다. 현실에서도 제적과 평화 염원이 같은 공간에서 상존한다.
강화평화전망대 옆에는 실향민들이 독립운동가인 애사(愛史) 편강렬(1892~1928) 선생을 위해 세운 ‘애사 편강렬 의사 추모비’가 있다.
인천민예총 강화지회와 전교조 강화지회가 해마다 발행하는 잡지 ‘강화시선’ 제16호(2024~2025)의 ‘강화를 닮은 사람들’ 코너에는 최보길 산마을고등학교 교사가 쓴 ‘제적과 평화의 전망 위에 선 애사 편강렬’이 실렸다.
최보길 교사는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난 편강렬은 국내에서 을사의병을 시작으로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을 이끌었지만, 끝내 자신의 고향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만주 땅에 묻혔다”며 “애사 편강렬 의사 추모비는 고향을 향한 실향민들의 그리움을 담아 이곳에 서 있다”고 편강렬과 그의 추모비를 소개한다.
편강렬 선생은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보이는 황해도 연백 출생이다. 열여섯 살 되던 해에 을사늑약에 반대해 영남 출신 의병장 이강년이 이끄는 부대에 스스로 가담했으며, 1907년 일어난 정미의병 때는 연합 부대인 13도 창의군으로 서울 동대문 인근까지 진격하기도 했다.
편강렬 선생은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신민회 황해도지부에서 활동했다. 105인 사건이라 불리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1만세운동 때 황해도 연백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등 국내 활동으로 또다시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편강렬 선생은 출옥 후 가족과 함께 만주로 건너가 1923년 양기탁 등과 함께 의성단을 조직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의열단과 함께 대표적 의열투쟁단체로 꼽히는 의성단은 친일파를 처단하고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기관을 공격했다. 중국 장춘 일본영사관을 습격하고 일본군 200여 명과 시가전을 벌였으며, 봉천의 일본 경찰서를 파괴했다.
남만주 독립운동 세력 통합 과정에서 일제에 체포된 편강렬 선생은 신의주 감옥에 투옥됐다. 모진 고문과 옥고로 인해 건강을 잃은 선생은 일본인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다 1928년 순국했다. “나 죽거든 유골을 만주 땅에 묻어 줄 것이요, 나라를 되찾기 전에는 고국으로 이장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으나, 아직 그의 유해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됐다.
최보길 교사는 편강렬 선생을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이육사(1904~1944)와 닮았다고 했다.
“베이징과 만주라는 조국이 아닌 타국에서 사망했고 고문 후유증이 죽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사망일도 1월6일로 같다. 또 호를 ‘육사’와 ‘애사’로 ‘史’를 호로 사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의열투쟁을 무장독립운동의 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 조국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서정적 언어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닮았다. 특히 의열단과 의성단이라는 의열단체에서 맹렬히 독립투쟁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삶이 비슷하다.” (44~45쪽)
편강렬 선생이 되찾고자 했던 나라는, 남북을 흐르는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만나는 저 강을 건너지 못해 고향 연백 대신 고향이 잘 보이는 제적봉에 자신의 추모비가 설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아니었을 것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지금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