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광명서 ‘아내 살해 사건’ 이전
4차례 경찰 신고… 현장종결 그쳐
‘부부사망 양평 방화’도 과정 비슷
“강압·통제시 즉각조치 개선 필요”

한 지붕 아래 가장 친밀했던 파트너가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전복되는 순간. 가정폭력 신고는 그 조짐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신호다. 그러나 피해자 외침은 ‘사소한 가정사’로 축소돼 허공을 맴돌다 낯설지 않은 결과로 돌아온다. 파트너의 살해다. 참변이 되풀이하는 사이 가정폭력법은 ‘가정유지’란 낡은 옷을 30년 가까이 벗지 못한 채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초동조치 미비점·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 피해자가 다시 안전한 관계맺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 편집자주
지난해 8월 5일 오후 2시30분께 50대 남성 A씨가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광명의 집에서 아내 B씨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했다.
사건 발생 전, ‘네 차례’ 경찰 신고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A씨의 범행이 살인에 이르기 전까지 지난 2023년부터 A씨와 B씨 사이 경찰에는 총 4차례의 가정폭력 등 신고가 있었다.
경찰은 “A씨와 다퉜다”는 내용의 B씨 첫 신고를 지난 2023년 4월 접수한 뒤, “A씨가 손찌검을 한다”(2023년 10월), “물건을 가지러 왔는데 집 문이 잠겨 있고 A씨가 열어주지 않는다”(2024년 1월) 등의 신고를 차례로 받았다. 이 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에 따른 긴급출동 사안으로 분류되는 ‘코드1’ 신고만 3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신고 접수 뒤 주거가 마땅치 않았던 피해자 B씨를 지인의 집으로 분리했을 뿐 경찰이 A씨에 대한 입건이나 임시조치를 진행한 건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과거 형사입건된 내역이나 대면 폭행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이 사안들은 현장에서 종결됐고, 마지막 신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씨는 A씨에게 살해됐다.

경찰은 당시 입건이나 접근금지 명령 등의 임시조치를 추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고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 발생한 것이고, 대면하지 않거나 단순 말다툼 뿐이었기에 (긴급)임시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 신고 뒤 살인’ 반복, ‘양평 사건’과 판박이
지난 4일 양평에서 발생한 ‘남편 방화 추정 부부 사망사건’ 전 가정폭력 신고 내용과 경찰 대응 과정은 광명 사건과 빼닮았다. 경찰은 양평 사건 하루 전 가정폭력 신고로 두 차례 현장에 출동해 남편을 집 밖으로 분리했으나, 참변을 막지 못했다.
가정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확산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친밀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경찰 조치와 현행 법 제도 틀을 전면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두 사건처럼 친밀 관계의 폭력이 순식간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물리적 폭행 없이 상대 의사에 반하는 강압·통제 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현행 위험성 판단조사표, 재발위험 평가척도 등 기준을 전면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지금의 가정폭력처벌법 역시 ‘가정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 온전한 피해자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자를 지키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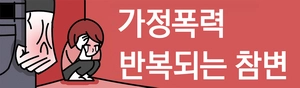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법보다 가까운 폭력… 현실과 먼 ‘분리’ 능사일까 [가정폭력 반복되는 참변·(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1/news-p.v1.20250211.300f4f76e890477eafe31d68b17ad5b1_T1.jpeg)
![반의사불벌 ‘가정폭력처벌법’ 재범 위험 늘린다 [가정폭력 반복되는 참변·(下)]](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2/news-p.v1.20250212.0fb504cd6a084615a728641f9d62186f_T1.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