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어겨도 피해자 말 못해
친밀관계속 위반시 신고 어려움
대부분 과태료뿐, 구속력도 없어
“분리후 위험도 시시각각 살피고
가해자 모르는 곳에서 보호 필요”

가정폭력 신고 뒤 경찰의 가·피해자 분리에도 피해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건 경찰 대응 지침과 법조문 속 ‘분리’가 현실에서 그만큼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다. 가해자의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는 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3일 오전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 A씨가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가정폭력 신고로 이미 임시조치(1~3호)로 분리된 상태였다. A씨는 그럼에도 B씨를 여러 차례 찾았고, 심지어 임시조치를 위반해 사건 1주일 전 추가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범행했다.
경찰·검찰을 통해 법원 영장 발부로 내려지는 임시조치(2개월)는 현장격리(1호), 주거지 또는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통신장비 접근금지(3호)를 포함해 유치장 입감·구치소 구금(5호)까지 가능하다.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의 현장 분리(응급조치)가 이뤄진 뒤 ‘남편 방화 추정 부부 사망’, 광명 ‘50대 남편의 아내 살해’ 사건이 발생한 것과 이보다 강력한 분리조치이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임시조치 상황에서도 참변을 막지 못한 것은 ‘가정폭력 신고 후 분리 조치’ 전반에 빈틈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경기남부지역에서 지난 3년(2021~2023년)간 가정폭력 신고로 내려진 (긴급)임시조치가 2천703건(2021년)에서 3천113건(2023년)으로 소폭 증가하는 사이, 해당 조치 위반 건은 194건(2021년)에서 292건(2023년)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경찰의 이러한 적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분석도 많다. 임시조치를 위반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도 친밀관계 속 쉽사리 피해사실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어겨도 대개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점도 법의 구속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장 경찰관들은 절차와 필요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진행한다면서도, 현행 제도상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경기남부지역 내 성범죄 담당 한 수사관은 “폭행이 있거나 폭행이 있을 위험성이 있으면 위험평가 조사서를 토대로 임시조치를 하지만, 반대로 위험성이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가 동의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임시조치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수사관은 “현장 위험도를 판단하는 조사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임시조치를 통해 일정기간 분리하는 게 재범 위험도를 어느 정도 낮출 수는 있겠지만 현장과 강력범죄 사례를 보면 능사가 아니다”라며 “분리 이후에도 가해자의 위험도를 시시각각 살피고, 피해자를 가해자가 모르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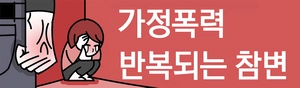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가정 지키려는 제도… 분리조치는 비극의 복선인가 [가정폭력 반복되는 참변·(上)]](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0/news-p.v1.20250205.893dee0f56d74aa4862ebb81c58f2253_T1.jpeg)
![반의사불벌 ‘가정폭력처벌법’ 재범 위험 늘린다 [가정폭력 반복되는 참변·(下)]](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2/news-p.v1.20250212.0fb504cd6a084615a728641f9d62186f_T1.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