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생활 보호 ‘ㅁ자형’ 안채
일제강점기 고급 자재로 외벽
함경도 목재·강화산 기와 사용
문화유산에 걸맞은 활용 절실

인천시 지정 유형문화유산 ‘강화 고대섭 가옥’이 빚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2월3일자 1면 보도)이 전해지자 문화계나 건축계에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이런 일이 흔치 않은 데다 문화유산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경인일보는 ‘강화 고대섭 가옥’에 담긴 건축적 가치와 이야깃거리는 무엇이고, 그 활용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고대섭 가옥은 전통 한옥 양식과 궁중 건축 양식, 일본 건축 스타일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있다. 고대섭 가옥은 6년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 1944년 완공됐다고 하는데, 당시 서울에서 유행한 도시 한옥 스타일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띤다.
궁중 건축 양식은 말 그대로 궁궐을 지을 때 사용하는데, 이 건축 기술을 고대섭 가옥에서 볼 수가 있다. 난방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본채 지하 공간이 궁중 건축 양식이라고 한다. 안채 밖으로 난 지하 계단을 내려가면, 어른 키 높이의 통로가 있다. 길다랗게 이어진 이 통로를 따라 곳곳에 마련된 아궁이에 숯을 넣어 불기운이 방구들을 통과해 바깥의 굴뚝으로 나가게 설계했다.

안채는 ‘ㅁ’자형 구조여서 안팎으로 뚫린 문을 닫게 되면 무척 폐쇄적이다. 이 집을 지은 고대섭이라는 인물이 그의 어머니를 위해 건축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집 구조부터가 여성의 생활을 보호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방마다 설치된 문에서 잘 드러난다. 이 집 문은 특이하게도 3중문이다. 미닫이 형식의 2중문에 여닫이 방식의 나무판 덧문을 달았다. 밖에서는 열거나 문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방범문을 덧댄 것이다.

안채 마당 부엌 쪽으로 우물이 있는데, 누런색 타일 벽으로 칸막이를 했다. 이 타일은 일제강점기 중요 건축물 외벽에 시공하던 고급 자재였다고 한다. 또한 대청 쪽에 연결된 방 안에서 부엌을 드나들 수 있도록 했으며, 바깥의 장독대는 부엌과 가까운 곳에 배치했다.
목재는 강화도 남산이나 북산의 것과 저 멀리 함경도 나무를 썼다고 한다. 함경도 목재는 황해도로 이어지는 바닷길로 실어날랐다고 한다. 석재는 석모도 사괴석 등을 사용했다. 특히 이 집 기와에는 ‘江華’(강화)라고 한자로 쓴 문양이 찍혀 있다. 강화도에서 기와를 따로 생산했음을 보여준다.

집 안채 대들보에 적은 상량문의 연도 표기 방식도 이채롭다. 우리나라 기원을 일컫는 단기(檀紀)와 일본식 연호인 쇼와(昭和)가 따로 적혀 있는 것이다. 또한 안채에는 ‘도꼬노마’라고 하는 일본 전통 가옥에서 볼 수 있는, 실내 장식 공간을 갖춘 방도 따로 있다.
정부 출연 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신치후 센터장은 “문화유산이 법원 경매에 넘어간 사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이니 만큼 그에 걸맞은 활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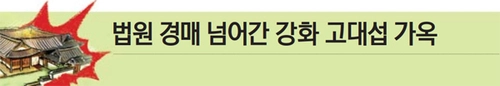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