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년 전 강화군 상거래 문화와
지역 탁주 제조·정미소 등 관찰 가능
개성 방식 경작 ‘인삼 재배’ 특징과
고대섭 母, 궁중 음식 담당 추정도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강화 고대섭 가옥’은 건축적 가치 이외에도 근현대 강화지역 경제사(史)의 단면을 보여주는 여러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 집에서는 강화의 100여 년 전 상거래 문화를 살필 수 있는 객줏집 이야기에서부터 강화 특유의 탁주를 만들던 송해양조장, 인삼 재배와 정미소 운영,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특수부대원들의 활동상 같은 특별한 이야기들이 줄줄이 흘러나온다.
고대섭 가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민가이면서도 궁중 건축 방식을 가미했다는 데 있다. 이는 건축주 고대섭이 그의 어머니가 젊을 적에 궁중에서 생활했던 점을 염두에 두고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대섭 어머니는 궁중에서 나온 뒤 강화에서 객줏집을 크게 했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가 음식 솜씨와 술맛이 장사를 좌우하는 객줏집을 운영했다면 아마도 궁중에 있을 때 음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31년 10월에는 강화지역을 비롯해 시흥, 부천, 김포, 파주, 장단, 개풍, 개성 등 8개 지역이 모여 술 품평회를 가졌는데 강화 탁주를 대표해 참가한 그의 어머니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신문기사도 있다.
조선 후기 강화지역 보부상과 객주 이야기는 황석영 소설 ‘장길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소재다. 강화는 한강의 나들목으로, 남북에서 서해안을 타고 들어오는 선박들의 중간 기착지였기 때문에 객주 세력이 어느 곳보다도 컸다.
객주를 하면서 재산을 불린 어머니는 아들 고대섭에게 송해양조장을 열어주었다. 고대섭은 정미소도 운영했으며 개성 방식으로 인삼 재배를 크게 하기도 했다. 강화도 인삼이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 개성 방식의 경작 때문이었다. 강화에서의 인삼 재배는 1900년대 초반 개성의 인삼 경작자들이 드나들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조장과 정미소는 고대섭 가옥과 가까운 곳에 있었으며, 인삼 재배는 강화지역 여러 곳에 밭을 두고 했다고 한다.
6·25땐 韓 특수부대 기지로도 쓰여
인천서 경제·문화사 간직 가옥 희귀
전문가, 보훈시설로서 가치 고평가

고대섭은 1950년대 강화지역이 국내 대표 섬유산업단지로 이름을 날릴 때에는 직물회사를 경영하기도 했다. 1959년에 발간된 ‘경기사전’에는 당시 강화지역 직물회사 현황이 소개돼 있는데, 여기에 고대섭이라는 이름이 ‘태양직물(太陽織物)’이라는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돼 있다. 회사 주소지는 고대섭 가옥이 있는 송해면 솔정리로 돼 있다. 고대섭은 그 시절 독일에서 방직 장비를 수입해 최첨단 시설을 갖추기까지 했으나 생각대로 안 풀리는 바람에 이 사업은 일찍 정리했다고 후손들은 전하고 있다.
고대섭 가옥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 특수부대 기지로 쓰이기도 했다. 1951년 첩보부대(HID)인 육군 제4863부대 강화유격대의 활약이 컸는데, 이 부대원들이 고대섭 가옥에서 주둔하면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인천의 오래된 집 중에, 특히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옥 중에 이처럼 다양한 경제·문화사적 이야기를 간직한 경우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이 집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국군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보훈시설로서의 가치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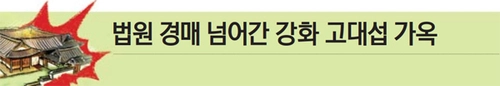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













![궁중 건축·일본풍 안채… 6년의 공사, 독특한 한옥 구조 [법원 경매 넘어간 강화 고대섭 가옥·(上)]](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09/news-p.v1.20250224.33042ee5fba24c5fbea0ebe46cd4bd10_T1.jpeg)
![[사설] ‘강화 고대섭 가옥’ 문화적 활용 높일 대책 세워야](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3/news-p.v1.20250131.e91724e77b744294a38b556fb2f08721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