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인천 남동유수지는 최적 서식지로 ‘교육 1번지’
1988년 전세계 288마리서 지난해 7천여마리로… 개체 수 증가에 큰 역할
고교 때 이기섭 박사 덕에 새 관심… 저어새 연구로 관계 중요성 깨닫기도
관찰 여건 많이 좋아져, 국내 물새 생태계 중요 종임을 더 많이 알리고파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조류 저어새에게 인천 남동유수지는 최적의 서식지다. 사람으로 치면 ‘직주근접형’ 도시인 셈이다. 먹이를 찾는 일이 곧 경제활동인 저어새에게 송도갯벌은 풍부한 먹잇감을 제공하고, 남동유수지에 위치한 2개의 인공섬은 새끼를 키우기 좋은 ‘교육 1번지’이기도 하다.
저어새는 인천 깃대종(자연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이다. 2009년 남동유수지에서 처음으로 둥지를 튼 개체가 발견된 뒤 이제는 매년 3월이면 200쌍 이상의 저어새 부부가 이곳으로 날아온다. 지난해에도 저어새 280쌍이 번식을 시도해 새끼 500여마리를 낳았다.
서식지 감소로 새끼 포기하는 저어새, 사람과 닮아… 보전활동 모두 위한 일

1988년 전 세계에 서식하는 저어새는 288마리에 불과했다. 그 이후 한국을 비롯해 대만·홍콩·일본 등 저어새가 머무는 주요 국가에서 활발하게 저어새 보호 활동이 전개되면서 지난해 기준 저어새 개체 수는 7천여마리로 늘었다.
멸종위기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보긴 어려운 단계지만, 저어새의 개체 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권인기 박사를 빼놓을 수 없다. 인천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장이자 저어새 보호 시민단체 ‘저어새와 친구들’ 대표를 맡고 있는 권 박사의 일상은 저어새로 시작해 저어새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조류 관찰 위해 ‘무인도 살이’까지… 선생님 대신 학자의 길로
지난 15일 인천 남동유수지에서 열린 ‘저어새 환영 잔치’ 행사에서 만난 권 박사는 저어새가 머물고 있는 남동유수지 인공섬 방향으로 자주 시선을 돌렸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가 최근 들어 인공섬으로 날아오는 숫자가 늘면서 저어새 번식을 방해할까 걱정 어린 모습이었다. 권 박사는 “가마우지가 인공섬에 접근하지 않도록 맹금류 모양의 연을 설치해 봤다”며 “한동안 잘 보이지 않던 가마우지들이 어젯밤부터 다시 찾아오기 시작해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말 없이 인공섬을 살피던 권 박사에게 조류 연구에 몰두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저어새 이야기를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권 박사의 표정은 마치 즐겁게 놀이터에서 뛰노는 소년의 얼굴처럼 밝아졌다.
그가 새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고등학생 때다. 현재 한국물새네트워크 상임이사인 이기섭 박사가 당시 권 박사의 스승이었는데, 수업 시간마다 국내와 해외에 서식하는 다양한 조류 사진을 보여주면서 흥미를 갖게 됐다. 권 박사는 “이기섭 박사님처럼 조류를 비롯한 생물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며 “대입을 앞두고 전공을 결정할 때도 박사님께 조언을 구했다”고 했다.
대학에 들어간 권 박사는 환경 탐사 동아리 활동에 매진했다. 탐조 활동을 위해 무인도에 들어가 한 달 넘게 생활할 정도로 매료됐다. 교직이 아닌 학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도 이 때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권 박사는 “새를 보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닌 탓에 학업은 뒷전이었다”고 웃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조류 연구자로 나아가는 게 더 재밌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했다.
■ 저어새 통해 배운 ‘관계’의 중요성
권 박사가 저어새 연구에 뛰어든 건 박사 과정을 밟던 2010년이다. 백로 연구로 석사 과정을 마친 권 박사를 저어새의 세계로 이끈 이도 이기섭 박사였다.
권 박사는 저어새를 연구하면서 스스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백로를 연구할 때는 오로지 새를 찾아다니는 활동이 전부였지만, 저어새 연구를 하면서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는 대신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많았던 권 박사에게 저어새는 ‘관계의 중요성’을 알려준 존재이기도 하다.
권 박사는 “2010년 강화도에서 열린 저어새 관련 국제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전문가·활동가들과 연구 자료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하게 된 게 계기였다”며 “이전에는 새가 좋아서 연구만 했는데, 저어새 연구를 시작한 이후 많은 사람과 관계를 쌓으면서 배우고 깨달은 게 많았다”고 했다. 이어 “저어새 보호라는 가치를 지닌 사람들과 함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다는 확신도 생겼다”고 했다.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자주 찾은 남동유수지에서 겪은 에피소드도 많다. 유수지 옆 컨테이너에서 한 달 동안 숙식하며 저어새 연구에 몰두하면서 처음 들은 새끼 저어새의 울음소리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권 박사는 “새벽이 되면 알에서 태어난 새끼 저어새들의 울음소리가 바로 옆에서 우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린다”며 “혼자 연구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저어새들이 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온을 느끼곤 했다”고 했다.
저어새를 관찰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좋아졌다. 연구를 시작했던 십수년 전 인공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는데, 전기를 끌어올 곳이 없어 자비를 들여 발전기를 사기도 했다. 지금은 생태학습관 건물에서 실시간으로 저어새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고 탐조대도 설치됐다. 권 박사는 “저어새 보호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가 예전엔 사무실이자 숙소였다”며 “처음 남동유수지를 찾았던 2009년과 비교하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활동 중인데, 그만큼 많은 시민이 저어새에 애정을 갖고 함께한 덕분”이라고 했다.

■ “저어새 사라지면 인천 조류 생태계도 위험… 개체 수 1만 마리까지 늘리는 게 목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소속해 연구자의 길을 걸었던 권 박사는 지난해 저어새생태학습관장을 맡으며 활동가로서 삶을 시작했다. 저어새가 국내 물새 생태계에 중요한 종임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다.
그는 “30년 사이 저어새 개체수가 20배 이상 늘었음에도 저어새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는 사자, 펭귄, 판다 등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과 비교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바다, 강, 논 등 습지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저어새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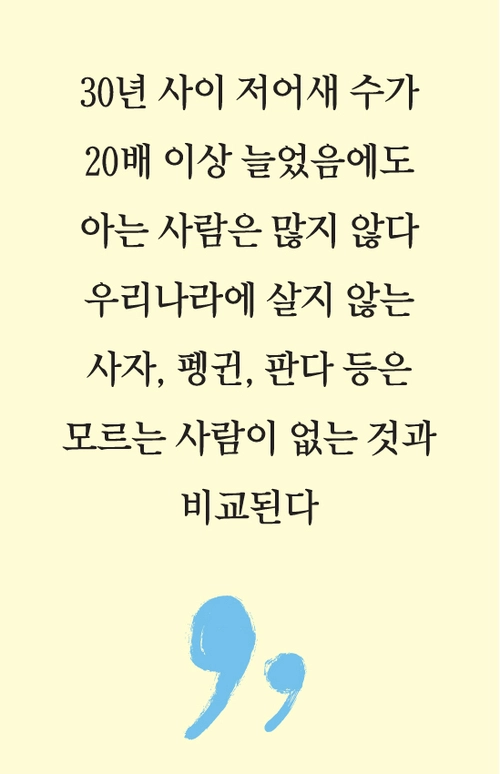
권 박사 목표는 저어새 개체 수를 1만 마리까지 늘리는 것이다. 특정 생물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최소 1만 마리 이상이기 때문이다.
개체를 늘리기 위해 서식지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저어새의 주 서식지인 갯벌 면적이 갈수록 줄면서 저어새들이 안정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아서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젊은 세대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대한민국 사회처럼, 저어새 역시 서식지 감소로 새끼를 기를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출생’ 현상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권 박사는 “인천 깃대종 저어새가 사라지면 다른 새들도 살아남기 힘든 서식 환경이 됐음을 의미한다”며 “저어새 보전 활동은 서식지를 공유하는 다른 물새들을 보호하는 일이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권인기 박사는?
▲경희대학교 생물학과·동대학원 박사 학위 취득 (2017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류팀장 (2018~2024년)
▲한국조류학회 이사 (2018년~)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
▲인천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장 (2024년~)
▲‘저어새와 친구들’ 대표 (2024년~)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 반복되는 ‘티케팅’ 몸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1/news-p.v1.20250204.0379f5406224439390b517694eb055ed_R.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