뗄수 없는 나의 수족, 종이와 필기구
감정의 기후 나타낸 보이지 않는 밭
간간히 옮겨 적는 흥미로운 문장들
물컵의 표면 장력처럼 나를 지탱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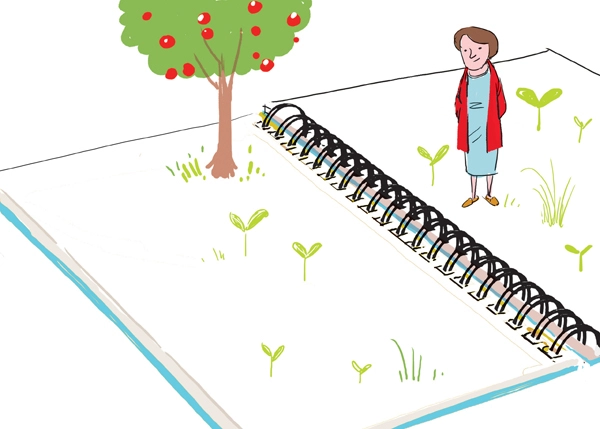

전생에 나무늘보가 아니었을까. 더없이 빈둥거리는, 혹은 빈둥거리고 싶어하는 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은 많지만 금방 싫증내며 다른데 기웃거리기를 좋아했다. 해야 할 일들을 지속적으로 게을리 하다보니 호기심과 그것을 메모로 번역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고 어느덧 소설을 쓰게 되었다.
메모 또한 한 두 해 만에 생긴 버릇은 아니다. 기자를 하던 시기에 취재노트를 쓰다가 백수가 되자 노트만 덩그러니 남겨졌는데, 그 다음부터 생각을 건드리는 것들을 끄적거리게 되었다. 취재원의 말과 내 의견을 구분해서 쓰던 버릇이 남아 책 속의 문장은 색깔이 있는 펜으로, 내 생각은 연필로 바꿔가며 쓴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길이 나면 그 길을 오가기 마련이라 노트와 필기구는 나에게 뗄 수 없는 두 번째 수족이 되었다.
나는 얇은 두께의 줄 없는 노트를 쓰는데 부지런하면 한 달, 그렇지 않으면 두세 달에 한권쯤 다 쓰는 것 같다. 그래서 한해가 끝날 때 올해 몇 권이나 썼나 세보는 것으로 얼마나 읽고 상상했는지 가늠하게 된다. 새 노트를 펼쳐 들 때는 언제나 기분이 좋다. 맨 위에 시작하는 날짜를 쓰는 순간은 오래 전부터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노트 겉면에는 그 기간에 읽었던 가장 흥미로운 문장을 간간이 옮겨 적는다. 이 문장들이 나의 정신적 외골격을 형성하고, 물이 가득 찬 컵의 표면장력처럼 나 자신을 넘치지 않게 지탱해주는 느낌이 든다. 이런 노트가 차곡차곡 쌓여있는데, 표지가 전부 다르다는 점에서 좋다.
안에는 규칙 없이 별별 것을 다 적는다. 밑줄을 치다 못해 별표까지 표시해놓은 책 속 문장을 노트에 내 글씨로 옮겨 놓지 않으면 독서를 마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연필로 덧대어진 내 생각들이나 감정 크로키 같은 글도 나오고, 느닷없이 보이지 않는 장부가 내려와 원고료 계산을 하거나 손 가는 대로 그려진 그림도 등장한다. 그러다 추수할 때가 되면(소설 마감이 시작되면) 커다랗고 구멍이 뚫린 체에 거르듯 노트 속의 내 글 가운데 쓸만한 것들을 훑어낸다.
나에게 노트는 보이지 않는 밭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난 게으른 농부라서 씨를 마구 뿌려놓은 뒤 발아한 싹에 정기적으로 물을 주지도, 바람을 막거나 지지대를 세워주지도 않고 심지어 열매를 맺은 것조차 제때 따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어떤 열매는 달콤한 과육을 간직한 채 아깝게 노트 밭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경작을 해서야 평생에 책 몇 권 소출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나의 리듬을 바꿀 생각은 없다.
최근 시작한 강의 첫날에 수강생들과 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명 빼고 전부 종이노트를 쓰고 있었다. 한 권이 아니라 두 권 이상 쓰는 사람도 있고 크기와 두께, 용도를 분류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듣다보니 재미있었다. 친구가 가죽장정을 만들어준 노트에 속지만 바꿔서 쓰는 이도 있었고, 매장에서 사오는 건 내 노트 같지 않다며 종이와 스프링을 따로 구입해 매번 만든다는 사람도 있었다. 한 사람이 노트는 감정의 기후를 보려는 용도라고 표현한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날씨는 매일 변하지만 기후는 그런 날씨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 매일매일 쓰는 글들이 들쭉날쭉 하지만 한 권을 다 쓰고 보면 그 무렵의 관심사나 감정이 한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니까. 무엇보다 즐거운 것은 노트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모두 같은 포맷에 맞추지만 종이 노트는 똑같은 것이 없다. 손 글씨는 지문만큼이나 고유하고 백업할 수 없는 이 불완전한 매체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오늘은 새 노트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날이다. 새로운 노트는 예감으로 팽팽하고, 아직 쓰지 않은 글자들로 감춘 채 비밀스러운 침묵에 잠겨있다. 수성 펜으로 오늘 날짜를 써서 침묵을 깨트린 후 너른 종이 마당을 천천히 산책해 본다. 앞으로 만나거나 만들어갈 문장의 덤불이 하얀 눈 이불에 덮여 있는 이 상태를 잠깐 더 즐기다가 천천히 시작하려 한다. 종이는 아직 많으니까.
/김성중 소설가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