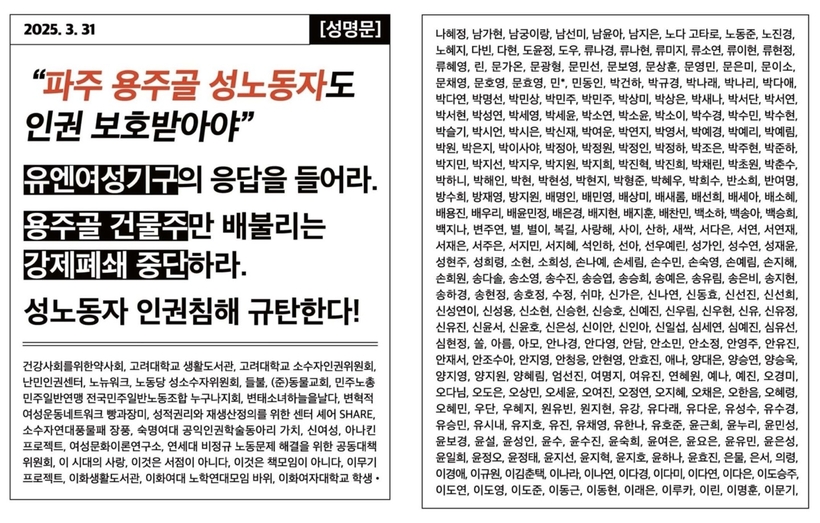사라지는 기숙사에 남겨진 흔적들
마지막에 남긴 낙서 누가 읽는가
이 불균형으로 극적 긴장감 더해
기억의 장소이자 연대의 장소 상실
벚꽃엔딩, 새로운 시작 의미 담아

연극 ‘얼떨결에 종언’(데구치 메이·오오타 유우시 작, 변영진 연출, 3월20일~4월13일, 소극장 산울림)은 사라지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배경은 2013년 3월의 교토대학교 기숙사이다. 이 기숙사는 1913년에 지은 목조건물이다. 백 년이 넘었다. 낡고 헐었다. 기숙사를 허물려고 한다.
사라지는 것들은 건물만이 아니다. 장소가 사라지면 함께한 시간이 흩어진다. 연결되었던 관계가 무너진다. 무엇보다 사람이 사라진다. 이제 기숙사생은 어디로든 떠나가야 한다. 마지막까지 남은 다섯 명이 여기에 있다. 와타나베 미츠키, 코다마 카나에, 마에노 츄키치, 니시지마 신타로, 그리고 미노베 사나코. 이 다섯 명이 하루에 한 명씩 떠나간다는 게 연극의 설정이다. 그렇게 기숙사를 떠나가야 하는 다섯 명의 이야기가 5일 동안 펼쳐진다.
이 기숙사에는 오랜 관행이 하나 있다. 기숙사를 떠날 때 낙서를 남겨야 한다. 벽에 낙서가 가득 찬 이유다. 낙서라고는 하지만 자신만의 문장에 가깝다. 기숙사를 통과하는 자가 남기는 의례에 가깝다. “벽에 글씨들이 빛이 나”, “내 글씨도 빛이 날까요?” 떠난 사람들, 통과한 사람들의 말들을 보면서 이토록 절절하다면 의례가 갖는 무게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학가의 오래된 호프집 벽면의 색이 바랜 낙서에도 인생이 있는 법이거늘 하물며 여기는 대학의 기숙사가 아닌가. 허투루 남길 수 없다는 모종의 긴장감이 연극을 이끌게 된다.
다섯 명으로 시작하여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한 명씩 낙서를 남긴다. “2년이지만 잊지 않을 거야.” 미츠키가 가장 먼저 떠난다. 하루가 지났고 네 명이 남는다. “부활 전에 죽음이 있다.” 카나에가 다음으로 떠난다. 이틀이 지났고 세 명이 남는다.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나의 괴로움을 알리.” 츄키치가 이어서 떠난다. 사흘이 지났고 두 명이 남는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후의 날이다. “옳다고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타로가 그다음으로 떠난다. 그렇게 나흘이 지났고 한 명이 남는다. “치열하게 살아라. 나는 걸어간다.” 혼자서 대화를 나눌 수 없으므로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혼잣말로 중얼거리게 된다. 이 장면이 짧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사나코가 마지막으로 떠난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남긴 낙서는 누가 읽는가. 앞서 떠난 사람이 남긴 낙서를 뒤에 남은 사람은 읽을 수 있다. 먼저 떠나는 사람은 나중에 떠나는 사람의 낙서를 읽을 수 없다. 이 불균형으로 약간의 극적 긴장감을 더한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이 겹친다.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낸 브룩 하트렌은 생을 마감하기 직전이 돼서야 사회에 나왔으나 적응이 어렵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외길이다. 죽기 직전 그는 자신의 흔적을 싸구려 호텔 방 벽면에 각인한다. 놀라운 것은 브룩 하트렌 말고도 이미 여러 이름이 그곳에 각인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교토대학교의 이 기숙사에는 텃밭이 있었다고 한다. 닭과 토끼도 길렀다. 물론 먹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치의 문화가 있었다. 모든 규칙을 학생들이 직접 세우고 운영했다. 자기 삶의 규칙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일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독재의 시간이 열려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라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음 주에 없어지잖아요.” 이 주어진 시간표 앞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집회를 연다. 그러므로 사라지는 것들의 목록에 단지 낡은 목조 건물만을 올릴 일이 아니다. 그 목록에 기억의 장소이자 연대의 장소를 상실했다고 올려야 한다. 아마도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최고의 장소를 상실했다고 올려야 할지 모른다.
연극 ‘얼떨결에 종언’ 마지막 장면에서는 낙화하는 벚꽃이 텅 빈 무대를 뒤덮는다. 그야말로 벚꽃엔딩이다. 일본은 입학식이 4월에 있다. 그에 맞춰 벚꽃이 핀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벚꽃 개화가 3월로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3월에는 졸업식이 있다. 벚꽃 없는 입학식과 벚꽃 있는 졸업식을 일본 문화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모양이다.
/권순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