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 22일, 70대 장애인 노부부가 시흥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로 지상 역사에 오르던 중 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치료 중 숨졌고, 할아버지는 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역귀성해 설 연휴 전날 서울의 아들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해당 리프트는 설치 6개월밖에 안 된 새 기계였다.
이 참사 이후 장애계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을 넘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명명한다. ‘이토록 평범한 일상에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가’ 이들은 정부의 ‘근사한 행사’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억눌렸던 인간다움에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발생 24년이 지나 다시 장애 차별 철폐의 날을 앞둔 시점, 이들의 당연한 요구는 어디까지 닿아 있을까.
“대다수 중증장애인들은 자립의 기초인 ‘이동’조차 보장받지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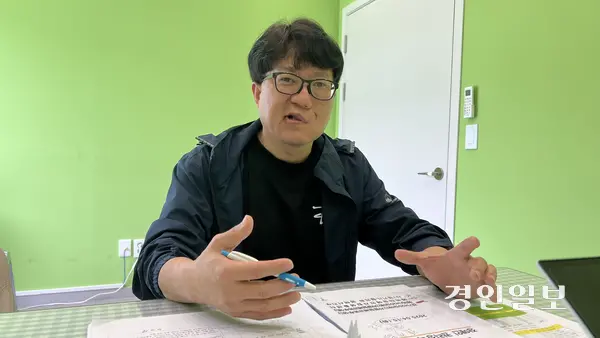
지난 18일 만난 이창균 평택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이 같은 물음에 여전히 긍정적인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인간다움을 얘기할 때 가장 기초적인 지표로 삼을 만한 이동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이 센터장은 “평택에서 이동·가사·사회활동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10명 중 1~2명 수준”이라며 “이들은 장애 정도가 심해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가사·사회 생활을 지원사를 통해 돕는 정부 사업이다. 수급자의 여건을 고려해 최대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평택에서 24시간 케어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고작 8명뿐이다.
경기도 전역으로 넓혀도 ‘수급 사각지대’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등록 중증장애인(65세 미만) 13만6천755명 가운데 정부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이는 3만1천849명(23.29%)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 4명 중 1명만 최소 시간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는 셈이다. 평택뿐 아니라 가평군(12.9%), 안성시(13.58%) 등 도농복합 성향이 두드러진 지역에서 특히 낮은 서비스 이용률을 보이는 점도 눈에 띈다.
이 센터장은 “재가 장애인이 많고, 장애인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내 교외지역에서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건 여전히 이런 기본적인 정부 사업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과 ‘가족과 형제·자매가 장애인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오래된 인식이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낮은 이용률 문제와 함께 수급 대상자의 서비스 시간 산정 방법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이 수급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나와 단시간 조사한 뒤 지원급여(시간)를 정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수급자의 조건과 정확한 상태를 판정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사로·저상버스… 그들의 소박한 ‘바람’

이날 센터에서 함께 만난 중증장애인들도 자립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면서도,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이동을 위한 작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지길 바랐다. 지체장애인 박성호(58)씨는 “활동 지원서비스로 이동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원사의 도움으로 인한 서비스뿐 아니라 휠체어 접근이 수월해질 수 있는 동네 식당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와상장애를 가진 홍석준(56)씨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요가 있는 건물마다 지자체가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부터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동권 개선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추가 도입과 저상버스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계획, 자립생활을 돕는 자립센터의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엔 현재 이 같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에바다 센터 1개소가 유일하다.
장애 당사자이기도 한 이 센터장은 과거 자신의 비장애인 시절 해외 경험을 떠올리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거리에서 한데 뒤섞여도 어색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희망했다. 이 센터장은 서른여섯 살이던 2007년 갑작스런 뇌종양 수술을 받고 편마비 후유 장애를 입었다.
“캐나다 어학연수 갔을 때인 2002년, 토론토와 2시간여 떨어진 런던이란 도시 거리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당시는 ‘장애인들이 많은 도시’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장애를 갖고 난 후 선입견이었단 것을 깨달았죠. 우리 사회도 언젠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