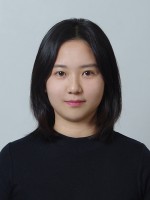보호라 쓰고 구금이라 읽다
화성외국인보소호, 극도의 통제
철창속 생활, 통신·면회도 제한
모호 사유로 ‘독방 수감’ 주장도
“여전히 징벌적 문화 남아있어”

‘보호소’라는 이름에서 안락함이 연상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현실은 거칠었다. 철창, 좁은 공간, 제한된 소통, 규율 아래 사람들은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이곳을 나섰다 해도 진짜 자유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지난 28일 취재진은 보호조치 일시해제 상태인 모로코 출신 20대 이스마일(가명)씨와 함께 출입국사무소 심사에 동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이스마일씨에게 “한국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3개월 연장이 허용됐지만 이후에는 출국을 요구받았다.
심사는 허용이 아니라 통제의 연장이었다. ‘은혜’를 강조한 언어 속에는 권리가 아닌 시혜의 논리가 엿보였다. “다음에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식의 압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절차는 사실상 일방적 통보에 가까웠다.
보호소를 떠났지만 이스마일씨의 삶은 조건과 감시에 묶여 있었다. 보호조치 일시해제로 풀려난 그는 여전히 매달 출입국사무소를 찾아 심사를 받아야 했다. 2천만원에 달하는 고액 보증금, 정해진 거주지 제한, 정기 출석 같은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이스마일씨는 심사를 마친 뒤 여전히 떨치지 못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출국을 앞둔 외국인을 수용하는 전국 3개(청주·여수) 보호소 중 하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나은 삶과 자유를 찾아 무슬림 국가인 모로코를 떠났지만, 실제 마주한 현실은 달랐다. 그는 곧바로 “들어간 지 하루 만에 나가고 싶었다”며 당시 기억을 꺼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12인실, 하루 30분 허용된 운동, 제한된 통신과 면회. 열 명 넘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뒤섞여 지냈다. 이중 철창과 보호복 착용 의무, 엄격한 통신 통제 속에서 일상의 감각은 점차 흐려졌다. 보호규칙과 공지사항은 대부분 한국어로만 제공됐다. 이스마일씨는 “무슨 규칙인지 읽을 수가 없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폭력적 제압도 있었다. 보호소 내 출입국사무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일곱 명의 직원이 달려들어 강제로 끌고 갔다. 손목이 꺾이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압박당하는 이른바 ‘새우꺾기’가 이뤄졌다. 이후 그는 ‘지시 불이행’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독방에 수감됐다.
이날 통역을 맡은 한나현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활동가는 “보호소는 사람을 벌주기 위한 곳이 아니다. 그런데 여전히 징벌적 문화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다른 면회 과정에서 목격한 장면을 언급했다. 그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지만, 접견실도 아닌 철창과 아크릴판 너머로 얼굴을 봐야 했다”고 전했다. 교도소가 아닌데도 차가운 플라스틱 벽이 아기와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외국인보호소는 ‘보호’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영어로는 Detention Center, ‘구금센터’로 불린다. 한나현 활동가는 “보호소 안과 밖은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통제의 세계”라며 “보호소에 갇힌 사람들 역시 쉽게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마일씨도 조용히 덧붙였다. “살아 있지만 존재를 잃게 만드는 곳. 그게 제가 있던 화성이었어요. 그곳을 떠났지만 여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보호소를 나섰지만 구금은 끝나지 않았다. 이름과 현실은 엇갈렸다.
이와 관련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본부인 법무부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유혜연·목은수기자 pi@kyeongin.com


![[‘걸산동’ 통행제한] 경기 남·북부 차이가 불러온 분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29/news-p.v1.20250418.44b0d189238a47009a0203975449e70c_R.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