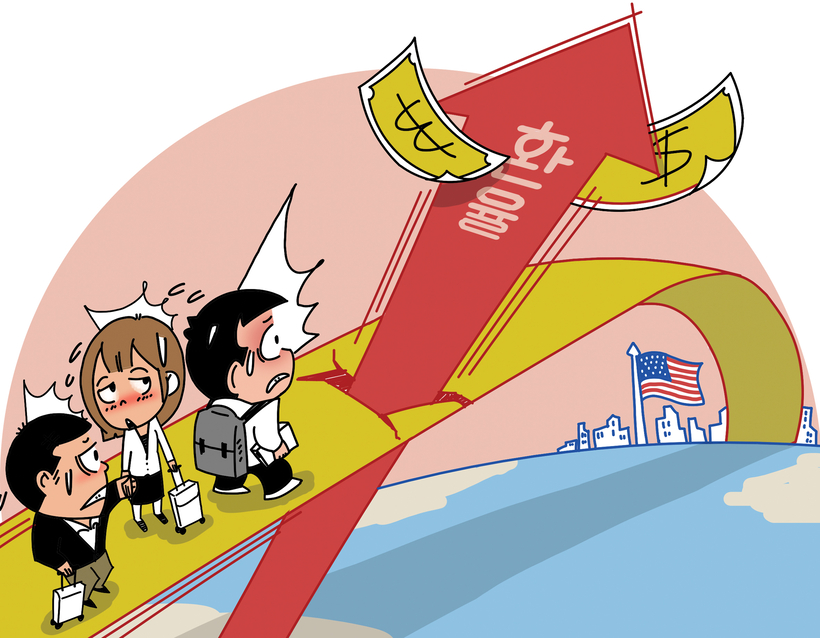작년 과학상식에 대한 한 설문에서 '미국민의 62%가 진화를 믿지 않고, 53%가 지구 나이가 6천살 이라고 믿는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첨단과학'과 '독실 신앙'이 교차하는 미국의 경우 2004년 일부 공립교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교육시 '진화론'의 대안으로서 '지적설계론'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되었다. 이 시도는 1년 만에 학부모와 진보진영의 반대로 좌절되었지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지적설계론' 옹호그룹의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실험적 검증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과학계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인 '망상의 신'에서 과학저술가 리차드 도킨스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믿음'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국가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며 과학기술과 종교와의 활동 영역이 점점 더 중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조주의적 종교와 맹목적 과학주의는 갈등과 충돌을 초래한다. 첫 해결 방향으로 과학과 종교의 분리를 통한 안정이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종교는 믿음과 권위, 과학은 사실과 검증 등 상호 차이를 부각하고 그 활동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상호 논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곧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 있다. 한편 과학과 종교의 섣부른 융합시도는 오랜 역사적 뿌리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자칫 '지적설계론'과 같이 대중을 오도할 수도 있다.
한편 과학의 '가치중립적'이고 '무신론적 측면'과 일부 '과학주의' 주장으로 인해 종교계의 과학에 대한 오해와 우려도 큰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과학은 실제 작동하고 있는 체계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점 더 자연의 많은 부분이 과학을 통해 설명되어지고 있다. 태양계와 은하의 발견을 통해 지구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빅뱅과 멀티버스 (multiverse) 등 첨단 물리이론은 수많은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한편 유전자, 카오스, 복잡계, 뇌과학의 발전으로 마음이란 미지의 영역도 개척되고 있다.
과학과 종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상호교류와 보완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존 호트 방식으로 상호 겸허한 자세로 '접촉'을 시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측정과 재현이 가능한 영역에서 합리적 접근을 추구하지만, 개인적 신념도 포함된 과학의 코스가 반드시 직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종교인도 합리적 토론과 비판이 허용되는 '지적 정직성'을 통해 합리적 우주관의 형성과 체계적인 도그마의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적 발견은 종교적 의미의 틀 안에서 해석되되, 반드시 과학으로 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과학적 신념이 종교의 지평을 넓혀주고 종교적 신념의 관점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과학계와 종교계의 상호 교류 노력이 활발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1987년 이후 티베트 승려와 과학자의 정기모임인 '마음과 인생에 대한 학술회의', 작년 11월 노벨상 수상자와 철학자 등이 치열한 토론을 벌인 '신앙을 넘어', 그리고 지난 주 과학기술부와 과학문화재단이 주최한 '과학기술, 종교를 만나다'라는 주제의 '새로 보는 과학기술 포럼'이 대표적 사례이다.
천재과학자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은 '종교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고, 과학없는 종교는 눈이 멀었다'라고 했다. 종교와 과학 모두가 인간의 삶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달라이라마의 조언처럼 고대의 지혜와 현대과학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 승 환(포항공대 물리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