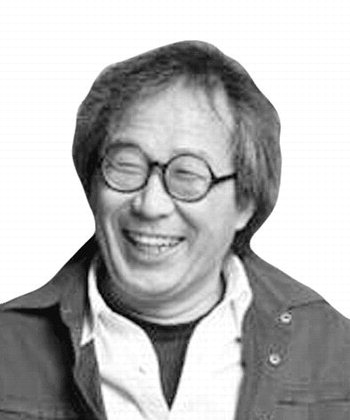
르네상스 시대의 사회에 대단한 영향을 준 이 책은 급기야 신도시의 중요한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이윽고 유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한 신도시들이 아프리카 북부에서 스칸디나비아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 유행처럼 세워졌다.
르네상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유토피아의 꿈은 변하지 않았다. 시대마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등장한 신도시 모두가 이상적 세계를 동경한 것이었으며 현대의 마스터플랜이라는 도시계획의 수법도 유토피아의 실현을 목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현된 유토피아의 사회가 그야말로 이상향이었을까? 불행히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범죄는 잘 계획된 도시에서 오히려 더욱 많아졌고 갈등과 대립은 전형적인 도시의 문제가 되었다.
우리의 땅에도 근대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은 많은 신도시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며 세워졌으나 많은 도시문제를 양산한 바 있다. 신도시는 그렇다 쳐도, 더 큰 문제는 오랫동안 고유한 삶터를 일구어온 우리의 옛 도시에 불기 시작한 재개발이라는 사업이었다. 우리의 마을은 서양의 도시와는 그 근본부터 다른 것이다. 머리 속에서 유토피아를 그려서 평면 위에 실현한 도시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산과 물이 만든 지리에 복속하며 일궈놓은 풍경이었으니 그 자체가 아름다운 산수화였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서양의 도시이론을 흉내낸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터가 유린당하고 만 것이다. 우리 옛 도시에 불현듯 등장한 아파트단지가 그 유토피아를 치졸하게 실현한 대표적 결과였다. 몇 채가 들어서든지 아파트 단지는 울타리를 치고 주변을 단절시켰으며 으레 몇 개의 출입구를 통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도시의 도로는 이 단지만 만나면 통과되지 못하고 둘러서 지나야 했다.
결국 도시의 섬이 되고만 아파트단지는 다른 섬들과 부동산가치를 놓고 늘 대립하며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적대적 공동체였다. 더구나 이 땅에 지어온 아파트는 사실상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야합한 결과였다. 정치가가 몇 채를 짓겠다고 공약하고 건설자본은 이를 뒷받침하여 그 임기 내에 졸속으로 지어댔으니, 어디에도 우리들 공동체의 삶을 위한 담론이 없었고 건축의 시대적 정신도 없었다. 그 분별없는 유토피아는 오로지 스스로 폐쇄함으로 고립된 부동산공동체일 뿐이었다.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말이 있다. 지옥향 혹은 암흑향으로 번역되는 디스토피아(Dystopia)라는 단어다. 1932년 알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타난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는 철저히 통제된 사회가 바로 이 디스토피아다. 외부와 소통되지 않는 이 디스토피아의 세계 역시 애초에는 유토피아를 꿈꾼 사회였으니, 결국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똑같이 폐쇄적 공동체인 까닭이다.
얼마 전 서울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투표가 있던 날, 서울의 최상류층이 산다는 어느 고층아파트 단지에서 투표참관인조차 출입을 거부당한 일이 발생했다.
외부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사회의 통념과 법규마저 무시하는 폐쇄적 공동체가 벌인 희극이었다. 이 공동체의 미래는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무엇이든, 폐쇄공동체를 지향하는 한 그 결과는 비극일 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