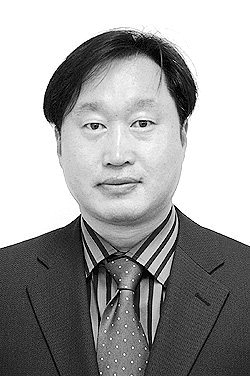
아무리 전근대 사회라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폭압과 착취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요, 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그도 모자라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를 빼앗았기에 끝내 백성들은 봉기의 깃발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홍경래의 거사 200주년을 생각하면서 수원을 돌아보았다. 수원은 과연 어떠한가? 과연 수원은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가? 또한 수원은 시민을 보다 평화롭게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시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대부분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구호를 내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당시 시대의 요구로 인해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구호를 내세우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결국 "부자되세요~"라는 텔레비전 광고에 따라 온 나라가 돈벌기 열풍에 휩쓸리기도 했다. '돈'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보다 중요한 시대였고, '인간'을 이야기하는 인간은 단군신화의 시대에 사는 고루한 인간으로 매도됐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데 '인간'은 사라지고 오로지 '물질'만이 권능의 자리에서 호령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였고, 지난 시절 수원만이 아닌 한반도 남쪽 땅 모든 곳에서 "돈, 돈!"하는 소리가 메아리로 퍼져 나갔다. 그런데 수원에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이 반갑습니다'라는 시정 구호를 보는 순간부터 감지했던 일이지만 새로운 시장이 수원을 '인문학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천박한 사회에서 다시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하겠다는 발상은 너무도 올바른 것이지만 한편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호인가 싶기도 했다.
우리 사회가 인간과 인간중심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지 너무 오래됐다. 개혁군주 정조가 돌아가신 이후 우리 사회는 '위민(爲民)'의 가치가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도정치시기를 거치면서 탐학과 학정이 전국을 지배하게 됐고, 그 결과 수많은 민란이 일어났다. 어둠이 짙으면 해가 뜨는 것이라 했다. 오랜 수탈과 고통은 마침내 동학을 통해 인간으로 회복을 선언했고, 1894년 농민들은 '사람이 곧 하늘'임을 이야기하며 세상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중들의 미약한 힘은 구호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었다. 결국 외세의 힘에 의해 다시 가진자들과 이방인들의 나라가 됐고, 끝내 몇십년의 치욕스런 일제 강점의 시대를 겪어야 했었다. 해방 이후 우리는 또다른 외세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으며, 그 잔존 세력들이 오늘날까지 정치와 행정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모조리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호 통재라!
이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와 행동이 아직도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공적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앞세우고자 하는 시대가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인간으로!'라는 선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수원시가 인문학의 도시를 천명하고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 문명사의 전환기적 발상이요, 고(故) 이영희 교수가 이야기했던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 도시 수원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왜냐? 그것은 바로 수원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통일과 물질문명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우리 민족의 변질된 민족성과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200여년 전 개혁군주 정조가 수원을 중심으로 조선의 문예부흥과 개혁을 추구하고, 새로운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문학의 가치를 높이 세우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문화를 바꾸어야 하는 민족사적 과제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