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오후 연평초등학교 운동장에 위치한 조립식 임시주택. 이 곳에 사는 안경애(64·여)씨가 쪼그리고 앉아 굴을 까고 있었다. 지난해 북한의 포격 당시, 안씨는 집이 불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임시주택에서 생활한 지도 약 9개월이 됐다. 안씨는 "수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직도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지 않냐"며 "임시주택이 있는 것 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불안해도 내 고향이 가장 좋다"며 "'좋다' '좋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백군식(73)씨는 지난달 말 새집에 입주했다. 백씨는 "새집에 들어오니까 좋다"며 "정부에서 튼튼하게 잘 지어줬다"고 했다. 또 "성금을 낸 분 등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연평도에서 석조 주택을 짓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배로 건축자재와 인부 등을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뭍보다 2~3배 더 든다고 한다.
연평초교 담장에는 '포격의 화약연기 평화의 꽃향기로 돌려보내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담장 위에는 '연평의 고통! 희망으로 바꾸자', '우리의 연평도 평화의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글씨가 적힌 돌멩이들이 진열돼 있었다. 연평중·고 학생들의 작품이다.
1년 사이 달라진 모습도 눈에 띄었다. 연평면사무소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움을 받아 지난 1일부터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당섬선착장에는 공영자전거를 빌려주는 곳도 생겼다. 연평도 곳곳에서는 대피소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을에서 포격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3일의 포격은 주민들의 뇌리에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
집 앞에서 아내와 함께 파를 다듬고 있던 이정규(74)씨는 그 날의 악몽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는 "대피소까지 가지도 못한 채 학교 담장 옆에 엎드려 있었다"며 "집 옆 대피소를 두고 학교 대피소까지 뛰어갈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10년 전에 연평도에 정착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며 "또 포격이 있으면 전쟁이 날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연평보건지소 정이선(33·여) 간호사는 "주민들이 북한의 포격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북한의 포격 이후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주민 분들이 계시다"고 했다.
한편, 경인일보의 연중기획 '세계의 전장 인천, 평화를 말하다' 시리즈도 연평도 포격 1주년에 맞춰 기사를 준비했다. 연중기획은 또 포격 1주년 특집기사와는 별도로 '한국전쟁' 이후 벌어진 여러 차례의 서해교전과 연평도 포격 등을 총 4회에 걸쳐 다룬다. 연평도 포격, 잇따랐던 서해교전 등 전투현장에 있었던 장병들과 피해자 가족 등을 직접 만나 당시 처참했던 '전장'의 상황과 그 이후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연평도 포격과 서해교전·천안함 사태 등을 다룬 외신들을 대상으로도 인터뷰한다. 그리고, 인천 앞바다 평화 정착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지상토론도 펼칠 계획이다.
연평도/목동훈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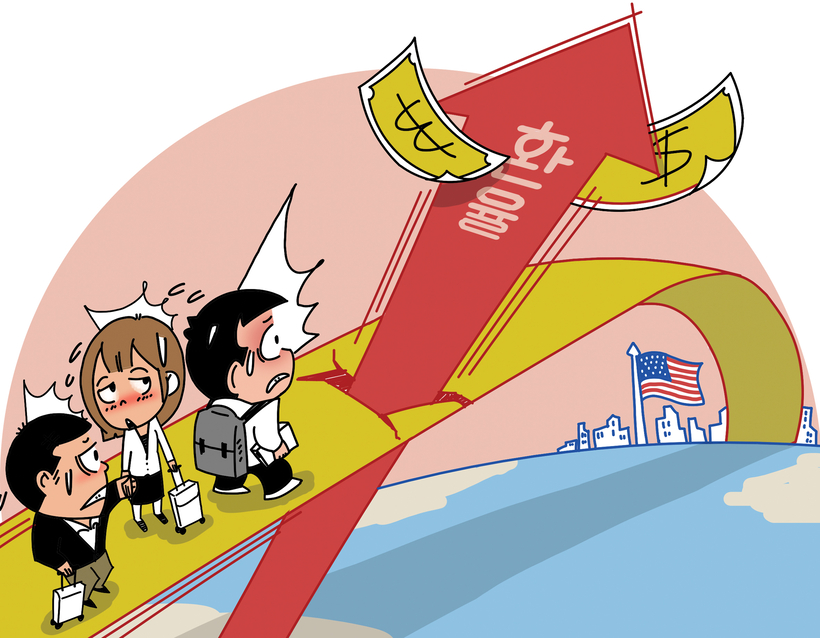









![[세계의 戰場 인천, 평화를 말하다·인천, '분쟁의 바다'가 되다 '그리고…'·41]60년만의 전쟁 '연평도 포격'](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111/618495_215140_954.jpg)
![[北포격, 그리고 1년 '연평도를 가다']주민들 안정 되찾아 가지만 아직도 '불안'](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111/618591_215245_1517.jpg)

![[北포격, 그리고 1년 '연평도를 가다']바닷속 수장된 '그날의 상흔' 가벼워진 그물 '한숨만 가득'](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111/618631_215263_3746.jpg)
지금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