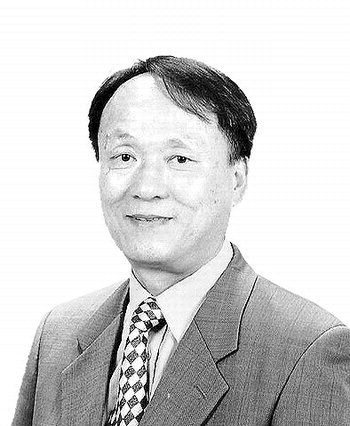
이러한 마찰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엇이 옳은지 궁금해 하고 있다. 가뜩이나 수많은 공권력들의 공정성 회복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오늘, 재건축 소형 강요가 공정한 공권력행사인지 의심되는 때이다.
주택 규모에 대한 공권력 간섭은 애초 중앙정부에 의해 자행되었다. 1980년대만 해도 무조건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일정지역에 소형 의무비율을 정해 행정지도를 했다. 이 대책은 주택건축을 위축시킬 뿐 효과가 없자 외환위기 직후 폐지되었다.
그러나 2003년에 이 제도가 수도권 재건축부지에서 더 강화되어 부활됐다. 명분은 강남재건축예정아파트값 상승에 찬 물 끼얹기였다. 이어 여러 가지 즉흥적 규제들이 더해졌는데, 모두 중앙정부에 의해서였다. 이러했음에도 당시 아파트 가격상승은 진정되지 않았다. 특히 중대형은 더 폭등했다. 그 후 10년여 되는 지금 돌연 규제권자가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바뀐 것이다. 규제목적도 주택보급률이나 투기억제가 아니다. 서민을 위해서라고 한다. 이처럼 규제비율을 높이고 주택면적도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정한 간섭일까.
그동안의 경험은 정부의 주택규모 규제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약 주택에 대한 선호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소형주택 늘리기 강요는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커진 중대형 주택값만 더 높게 상승시킨다. 그래서 소형주택 보유 서민들은 중대형에 비해 상대적 자본손실을 입게 된다. 자칫 빈익빈부익부만 더 심화되는 것이다. 더불어 시장 왜곡과 함께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면 도시 전체의 후생이 떨어져 무주택서민들도 손해를 입는다.
이와 같이 소형 강요는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과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만 높다. 그런데도 이를 시행하려 한다면, 아마도 정책은 동기만으로도 그 채택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의심된다. 사유부동산에 대한 사용규제는 원칙적으로 환경, 도시기반시설, 미관 등과 같이 외부성(外部性, externality)과 관련될 때 정당성을 갖는다. 면적처럼 내부규제가 정당하려면 위험예방이나 공익성이 더욱 분명해야 한다. 공익판단은 동기로서는 부족하고 효과가 중요하다. 자칫 서민들께 피해만 줄 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동정심(同情心)이라는 동기만으로 규제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공정성을 심히 의심받게 될 것이다.
재건축이란 자신의 헌집을 허물고, 새 집 짓는 재활활동이다. 정부의 역할은 규모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다수를 보호해 주는데 있다. 국민의 재산은 마치 인권처럼 모두 소중한 것이다. 가뜩이나 요즘 세상은 중산층 이하가 살기 어려워졌다 하지 않는가. 물가가 너무 오르는데 다수 서민들의 소득은 정체하고 있지 아니한가. 중대형보다 소형차가 훨씬 인기를 얻는 요즘 아닌가. 만약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살기 어려워진다면 너도나도 주거비를 줄이려 할 것이다. 그러면 강요하지 않아도 소형주택들이 대폭 늘어나게 되어있다. 이와 같이 시장이 할 일에 정부가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닌 것이다.
내 힘으로 내 집 짓는 분들께 큰 집 지어라, 작은 집 지어라 하는 공권력 간섭은 도시후생만 후퇴시켜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공권력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 해서 공공이 개입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간섭을 해선 안 된다. 잘못된 재건축규제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불확실한 공익성을 내세워 과거 중앙정부가 자행해왔던 잘못을 되풀이 하는 일은 삼가는 게 좋겠다. 서울시는 재건축사업 인가와 관련하여 공정한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숙고가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