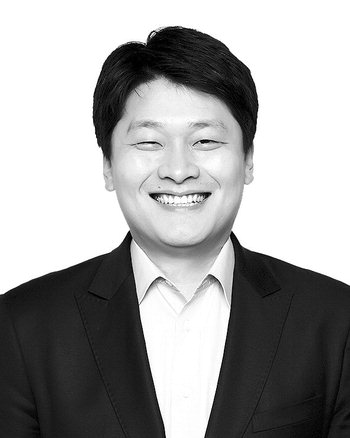
공생발전은 다양한 계층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생하는 시장 생태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공생발전이 시장에 맡겨지지 않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생태계가 아니라 동물원이라고 폄하한다. 또한, 이제 우리 모두는 마르크스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등장했다. 공생발전이 공동체주의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
경제 역사를 훑어보면, 정부의 시장개입은 몇 차례 있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은 상업자본주의 시대였다. 당시 최대의 국가과제는 부국강병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대자본과 결탁하게 됐고, 중상주의가 득세했다. 당시 정부는 오히려 시장에 개입해 중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했다.
중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중상주의를 반대했고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외쳤다. 이론적 뒷받침은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가 제공했다. 비로소 시장경제가 탄생하게 된다. 시장은 조화로운 자연적 질서이므로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이 필요치 않았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보면 이 과정에서 빈곤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과 현실은 같지 않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빈부 격차, 불황, 실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들이다. 처음에는 이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불황이 발생하면, 가격과 임금이 하락하고, 다시 수요와 고용이 증가한다는 경제논리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은 시장경제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 케인스다. 그는 불황과 실업은 시장경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부격차, 독과점 문제 해결도 정부의 몫이었다.
덕분에 세계 1차 대전 이후 장기 공황은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와 같다. 정부의 개입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다. 게다가 그렇다고 빈곤, 실업 등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 즈음에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1980년대이다. 경제 문제는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았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은 막강한 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가진 자가 시장의 조정자이자, 결정자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를 가진 자는 사회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를 향한 99%의 분노도 이런 이유에서 출발한다. 우연히도 99%가 가지는 의미는 중소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다. 과거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은 보호와 육성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자율과 경쟁으로 바뀌었다. 당시에는 시장개방이 큰 흐름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을 잘못 이해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으로 받아들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어찌 경쟁의 대상인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시장이 질서 있게 작동해야 한다. 대형마트를 없애자는 말은 아니다. 공생할 수 있는 시장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초원은 거대한 동물원이다. 사람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세렝게티의 사자는 사라졌을 것이다. 세렝게티를 보며 감탄을 하는 것도, 공생발전을 두고 동물원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모두 인간이 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