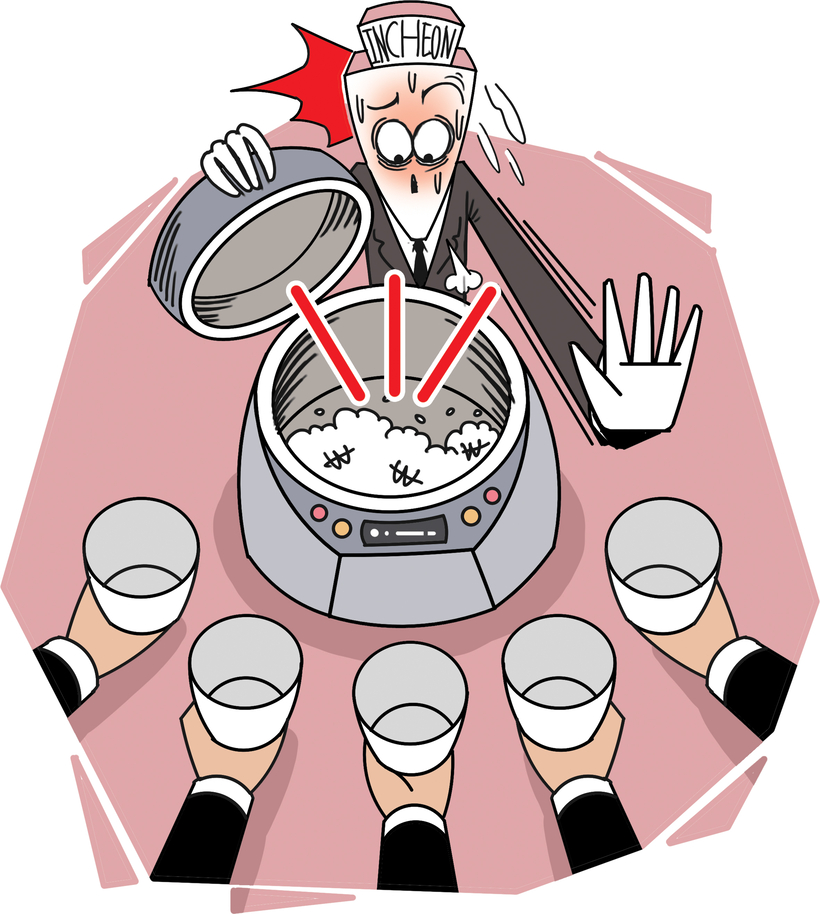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자마자 평소처럼 메일을 확인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음악을 보낸다. 옛날 생각 좀 해 보렴." 친한 친구로부터 온 메일이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배경으로 음악이 흐른다. 1888년 고흐는 약 9개월동안 함께 작업했던 고갱과 다툰 후 자신의 왼쪽 귀를 자르게 되고, 정신 이상을 자각하고는 스스로 생 레미 정신병원을 찾게 된다.
'별이 빛나는 밤'은 생 레미 병원에 있던 1889년 6월에 그린 그림이다. 돈 맥린이 부른 이 팝송은 예전부터 좋아해 친구와 즐겨 부르던 노래였건만, 이 아침 고흐의 그림을 배경으로 흘러나오는 곡조와 가사는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별이 빛나는 밤/ 그대 팔레트를 푸른 잿빛으로 칠하고/ 여름 날 내 영혼의 어둠을 알아보는 눈으로/ 밖을 내다봐요/… /난 이제 알아요 그대가 내게 무슨 말을 하려했는지/ 그대가 온전한 정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 사람들은 들으려하지 않았고/ 들을 줄도 몰랐지요/ 아마도 지금은 귀 기울일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에 일침을 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혼의 심연을 들여다보라고 질책하는 것 같기도 해서 가사를 음미해가며 들어본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소통이다. 그러고 보니 친구와 한 동안 대화를 별로 못한 것 같다.
마침 뉴욕 출장길이어서 내친 김에 '별이 빛나는 밤'이 소장되어 있는 MOMA(뉴욕 현대미술관)로 향했다.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의미를 발견하려는 듯 고흐 앞에 몰려 있었다. "오늘 아침 나는 해가 뜨기 훨씬 전 창 밖 시골 정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커다란 새벽별만이 있었다." 이 작품과 관련해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쓴 글이다. 고흐에게 상상력의 끝은 항시 자연을 향하고 있었다. 별들로 상징된 상상의 세계를 지향하는 역동성과 기억의 세계를 재현하려는 정태성이 거친 붓질로 재현되어 있다. 순간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고흐의 내면을 일별할 수 있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상과 실제의 대립이면서 양자의 결합이기도 하다. 소용돌이치는 하늘 아래 첨탑으로 상징되는 조용한 시골마을이 있고 두 세계 사이에 생 레미 시절 고흐가 즐겨 그리던 사이프러스가 있다. 뿌리는 땅에 있으되 저 높은 곳을 향하는, 화염을 환기시키는 사이프러스는 격동과 고요, 그리고 상상과 현실을 연계하는 상징물이 된다. 첨탑으로 의미화된 시골마을은 떠나온 조국 네덜란드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나온 것이리라. 이렇듯 자연은 고흐에게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갈등과 상충이라는 우주와 인간세계의 본래적 의미를 재현하는 심미적 공간이 된다.
발길을 돌려 지하철을 타고 거트루드 스타인 컬렉트가 열리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향한다. 조금씩 내리는 빗방울을 이마에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이 빗줄기가 점점 굵어진다. 미술관 앞에는 우산을 받쳐 든 예술애호가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번 스타인 컬렉트가 전시된 특별관에는 알 수 없는 흥분이 가득 차 있다.
스타인은 미술 수집가였던 동생 레오 등과 파리로 이주해 살롱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마티스, 피카소 등의 미공개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현대미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 시인이자 예술 후원자이다. 상당 부분 그들의 소장품인 약 200여점에 달하는 스타인 컬렉트 중 청동시대의 어둡고 음울한 피카소 앞에 한참을 서 있다 계단을 돌아 내려오며 얼핏 보니 희랍의 조각품들 사이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작품에 몰입하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 같았다. 인간과 예술이 하나가 된 순간이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환희로 가득찬 예술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이제 고흐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만 같다. 예술에 목말라 빗속을 뚫고 달려온 사람들을 보면서 삶이 고단할수록 예술은 우리에게 진정 의미있는 위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 역시 작품이 주는 깊은 영혼의 울림에 잠시 일상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 돌아갈 길은 멀지만 깨달음은 아주 가까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