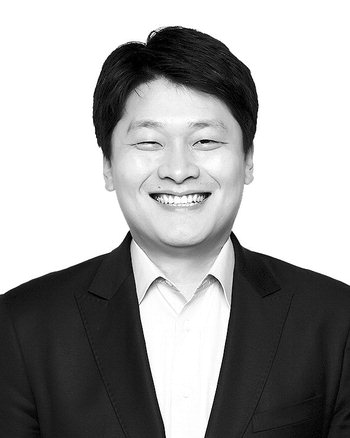
질적인 성장이 부진한 원인은 여러 가지다. 먼저,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2.8%이다. 미국은 6.9%, 일본은 9.5%, 독일은 10.8%이다.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기업의 효율성과 연결된다.
국가경쟁력을 발표하는 IMD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 효율성은 전체 59개국 중 49위이다. 중소기업이 강국인 독일은 2위, 미국은 4위, 이탈리아는 16위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에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경쟁보다는 '관계'에 의해 성장했다. 대기업과의 관계, 즉 납품관계가 성장의 핵심이다. 그러다 보니 매출의 대부분은 내수에 의존하게 된다. 매출의 85%가 내수이며, 수출은 15%에 그친다. 10년 전에 비해 내수비중은 상승했다. 그래서 FTA도 아직까지 큰 효과가 없다. 워낙 내수 중심의 판로가 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비난한다. 중소기업은 FTA를 발효해도 이용할 생각을 안 한다고 말이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부진한 이유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구조적으로 수출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조적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고착화된 납품의존도이다. 제조 중소기업 중 납품기업은 45.5%이다. 지난 10년 동안 20% 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납품기업의 매출 중 납품비중은 무려 80%를 넘고 있다. 매년 변화도 거의 없다. 매출의 대부분이 납품에서 발생하는 고착된 구조이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제법 탄탄한 중소기업이다. 기술력도 뛰어나다.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은 더욱 그렇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금속가공, 기계, 자동차 업종일수록 납품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이들 기업의 선택은 단순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글로벌시장 개척보다 안정적인 대기업 납품이 우선이다.
둘째, 한국 중소기업의 높은 중화학 공업 비중이다. 중소기업하면, 쉽게 경공업을 떠올린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제조 중소기업 중 중화학 업종은 65.4%이다. EU, 미국, 일본 모두 50% 내외이다. 첨단기술도 마찬가지다. 전자, 정밀 등 첨단기술 비중은 10%이다. 기계, 전기, 자동차 등 고기술은 30%가 넘는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다. 중화학 공업의 특성이다. 여러 부품이 모여 하나의 최종재가 탄생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수출을 하려면 외국 자동차 생산업체를 만나야 한다. 그러나 문턱이 너무 높다.
셋째, 중소기업이 수출을 할 때 물류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관세나 환율보다 중요하다. 관세가 1% 하락하면, 중소기업 수출은 0.5% 증가한다. 환율변동성이 1%로 줄어들면, 수출증가는 0.1%에 그친다. 이에 반해 수출대상국과의 거리가 1% 멀어지면, 수출은 0.7% 감소한다.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물류비용이 더 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 가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이 FTA가 발효됐다고 미국이나 EU로 수출을 하기가 쉽지 않다. 관세 인하 폭보다 추가 물류비용이 더 크면 수출을 할 이유가 없다. FTA가 발효돼도 중소기업 활용률이 부진한 이유이다.
중소기업 스스로 변해야 한다. 납품관계에서 벗어나 글로벌시장으로 뛰어들려면 스스로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수출지원 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소비재보다는 중화학 제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비재는 전시회나 시장개척단 지원을 통해 바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중화학 공업 비중을 감안하면, 외국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이 더 효과적이다. 전시회에서 부스 하나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니다. 외국기업 구매담당자와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또한,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과 물류창고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