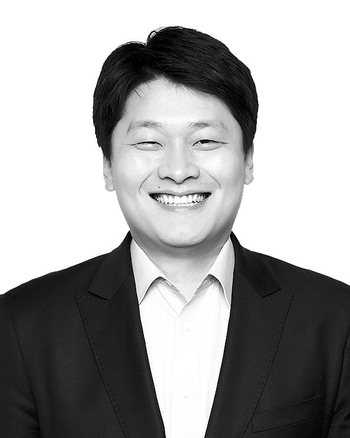
그러나 고민이 하나 남아 있다.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을 통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변화, 개혁, 나아가 혁명에 가까운 해체까지,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의 변화가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진정 경제민주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답을 찾아 나서자. 경제민주화 논의는 양극화에서 출발한다. 2000년대 중반 양극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이다. 유럽식이니, 미국식이니 하는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러나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논의는 시들해져 갔다.
2000년대 후반 양극화 논의는 동반성장으로 이동했다. 1%의 대기업과 99%의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때마침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한 99%의 분노는 한국의 동반성장에 힘을 보태 주었다.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휴학을 하고 일을 하는 대학생들, 폭등하는 이자에 시름이 깊어진 중산층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이 모여 99%를 이루었다. 그들은 1%에 분노했다. 99%를 파탄에 빠지게 한 1%는 여전히 높은 보수를 받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한가롭게 오페라를 감상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동반성장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적합업종 선정은 1년이 넘게 걸렸다. SSM(대형슈퍼마켓) 영업제한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 효과를 체감하기엔 시간이 짧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마냥 시간 탓만 할 수는 없다. 작년 여름 대기업의 MRO(기업소모성자재) 사업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삼성의 MRO 계열사 지분매각을 통해 중소기업은 좀 나아졌을까?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좀 올랐을까?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다. 국민들이 동반성장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동반성장도 이제 힘을 잃고 있다. 논의가 동반성장에서 경제민주화로 옮겨간 탓이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재벌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어떤 결말이 나든 고단한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양극화 해소든, 동반성장이든, 경제민주화든 99%를 위한 노력은 맞다. 그러나 99%를 중소기업이라는 한 덩어리로 봐서는 안 된다. 99%는 '덜 가진 자'이다. 1%의 '가진 자'와 99%의 '덜 가진 자'가 함께 할 때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열매가 결실을 맺는 것이다. 99%의 '덜 가진 자'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 아르바이트 해서 영어학원을 다니는 청년들,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엄마들, 더 일하고 싶은 중년의 아빠들, 뙤약볕 아래에서 좌판을 펼친 할머니들이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대체로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지니계수가 낮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소득에 비해 지니계수가 높은 편이다. 또한 소득 50% 미만의 인구비중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득 상하위 계층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11년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73만원으로 상위 20%의 5분의1 수준이다.
경제민주화는 '덜 가진 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가진 자'의 것을 '덜 가진 자'에게 나눠 주고 모두가 평균적인 삶을 살자는 것은 아니다.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이 경제민주화이다. 대기업만 '가진 자'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