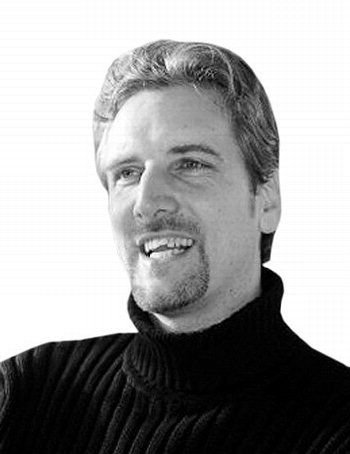
한국에 처음 발을 내디딘 지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껏 보아오던 급격한 도시화는 생각보다 더욱 무섭게 느껴진다. 설 연휴 서울에서 있었던 층간 이웃의 살해사건은 이런 급속한 사회 발전의 부작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한 남자가 두 명의 이웃을 살해한 이유가 층간의 소음 때문이라고 했다. 이 섬뜩하고 잔인한 범죄로 온 나라 사람들이 경악했고 모두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놀랐다.
설을 쇠고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오는 동안 나는 서울이 텅비어 있는 것 같았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는 다른 편 상행선에 비해서 또 다른 날들에 비해서도 매우 한산한 편이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에서 서울로 돌아오고 있던 길이라 서울 안은 몹시도 한가로웠다. 그러고 보면 서울에는 본래 서울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 가득 모여 사는 곳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이방인들의 거대한 도가니다.
안타깝게도 아파트에서 사는 우리네의 라이프 스타일은 명백히 이런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한다. 한 예로 광주에 처음 왔을 때 아파트에서 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 광주 방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살게 되었다. 그 동네엔 한국 그 어디에도 흔한 아파트 한 동 없이 오직 올망졸망 모여있는 작은 집들과 간혹 가다 남아 있는 한옥이 전부였다. 그래서 나의 아내와 나는 재미로 그 동네를 방림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사실 정겨운 작은 마을처럼 느껴졌던 곳이라 마을이라 불렀던 것 같다.
우리는 동네 이웃들을 잘 알았고 나이 많으신 이웃 어른들은 햇빛 좋은 날이면 어김없이 길가에 나와 앉으시곤 한나절 내내 얘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하셨다. 동네 곳곳 어디서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알고 우리도 그들을 잘 알아 서로가 인사를 나누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었다. 이후 아파트가 모여있는 신지구로 이사를 오면서 전에 느껴왔던 이웃 간의 정겨움은 찾기 힘들었다.
몇m 떨어지지 않은 곳에들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매우 조용할 때 들려오는 우리 집 밖의 목소리나 발자국 소리로는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그것도 몇 년을 가깝게 살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부끄럽게 느껴지고 다른 이방인과 더불어 사는 나도 그들에게 한낱 이방인에 불과하단 생각에 슬픈 느낌마저 든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디 출신인가가 언제나 중요하다. 사람들은 어느 김가인지, 이가인지 서로에게 물어보고 출신지역이 크게 같기라도 하면 친척이나 가족을 만난 듯 반가워한다. 서로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라왔는지에 대해 연관짓는 것은 사회적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 중요하리라. 현 서울은 어디에서도 어떻게든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었다. 명절 연휴로 비어있는 도시는 그것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큰 도시들에서의 익명성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존재하며 익명성은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나의 단순한 이론은 어쩌면 이번 사건에 부적절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공동생활에서의 소음으로 빚어내는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선 규제를 만들어 시설을 보강하고 공동생활 준수 강령이라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우선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옛날 한지붕 아래에도 여러 가족이 모여 살지 않았던가? 좁은 골목, 지금보다 좋지 않은 건축 자재 및 기술로 만들어진 집들이 모인 한 동네에서도 이웃과 정겹게 살지 않았는가?
충격적인 사건 이후 근래 더욱 극성스러워진 5살배기 아들이 우리 집 아파트에서 뛸 때마다 하는 것은 뛰지 말라고만 말하거나 다그치는 것이 아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의 이웃들과 가깝게 서있으면서도 어색한 침묵 속에 우두커니 서있을 것이 아니라 인사를 건네며 적어도 누군가 먼저 내려야 할 그때까지 몇 초간이라도 말을 걸어 보는 것이다.


![[‘걸산동’ 통행제한] 경기 남·북부 차이가 불러온 분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29/news-p.v1.20250418.44b0d189238a47009a0203975449e70c_R.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