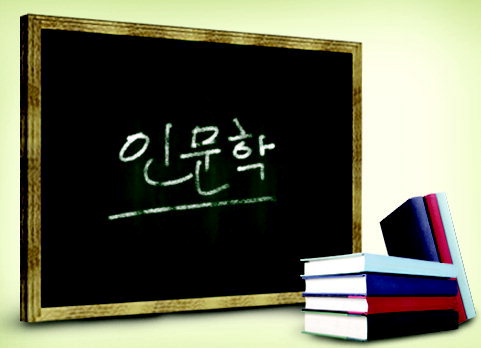
소품·이야기 통한 감성 표현
철학처럼 영화도 질문 던져
2013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하반기 과정이 시작됐다.
하반기 과정의 주제는 '영화로 읽는 인문학'이다. 최근 인문학이 일반시민 및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영화, 드라마, 그림과 같은 시청각 매체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강좌에선 영화학, 문학, 역사학 등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영화작품을 재료로 삼아 그 속에 담긴 인문학적 메시지를 해설해 준다. 편집자 주
영화의 영상언어를 분석하면 인문학과 만날 수 있다.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정재우 차장은 지난 24일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영화 읽기 그리고 인문학'이란 주제로 첫 번째 강좌를 진행하면서 "영화를 읽다 보면 인문학과 만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는 감성적인 포스터 문구로 유명한 영화 '건축학 개론'.
스무살 첫사랑이었던 두 사람이 15년 뒤 다시 만나 과거를 떠올리는 내용의 이 영화는 멜로적인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에게 다양한 말을 걸고 있다.
정 차장은 '건축학 개론'을 통해 영화의 영상언어를 소개한다.
영화는 다른 예술과 다른 고유한 언어로 의미를 생산하고 있는데, 크게 '미장센'과 '편집'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미장센은 하나의 쇼트를 구성하는 모든 것(조명·소리·세트·배우 등)을 의미한다.
영화 현재시점에서 서연(한가인), 승민(엄태웅), 은채(고준희)가 만나는 카페 장면을 예로 들어보자. 첫사랑 관계인 서연과 승민 사이엔 승민의 약혼녀인 은채가 앉아 있다.
이는 은채가 15년 만에 만난 서연과 승민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한다. 다음 만났을 땐 승민이 서연과 은채 사이에 앉아 있다.
승민을 사이에 두고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이 작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영화는 인물의 위치를 통해 전하고 있는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편집은 쇼트와 쇼트를 연결한다. 이 연결은 움직임을 만들고, 감정을 고조시키기도 하고, 의미를 강화하기도 한다.
영화 과거시점에서 '건축학개론'을 수강하는 승민이 서연과 같은 버스를 타고 정릉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과 수업 중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승민과 서연이 지도에 똑같이 그리는 장면을 교차편집한 것은 감정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정 차장은 "영상언어를 미장센과 편집으로 단순화시킬 수도 없지만, 이것은 영화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언어임에는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인문학은 '문학·역사·철학'을 뜻한다. 문학이 문자언어를 통해 감정이나 의미들을 생산한다면, 영화는 영상언어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역사는 문자언어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영화도 특정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감성구조를 여러 가지 소품과 이야기를 통해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철학이 세상과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라면, 영화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개념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영화를 읽는 행위는 인문학과 만나게 된다.
'건축학 개론'의 첫 장면은 낡은 집에서 시작하고, 4분의 3이 되면 승민이 지은 새로운 집이 나온다.
완성된 집은 과거에 있는 토대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재구성됐다. 현재와 과거는 그렇게 하나의 공간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정 차장은 "어쩌면 우리는 인문학이 낡은 집의 모습처럼 오래된 것이며, 가치없는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사람의 손을 통해 그 집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것처럼, 요즘 인문학은 새롭게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두 번째 강좌에서는 차인배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주제로 강의한다.
/김민재기자













![[2013 하반기 인천시민 인문학강좌·4] 영화 '최종병기 활'과 병자호란의 재해석](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311/781478_358837_54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