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완전한 생활속 주인공에
거짓위안 아닌 애도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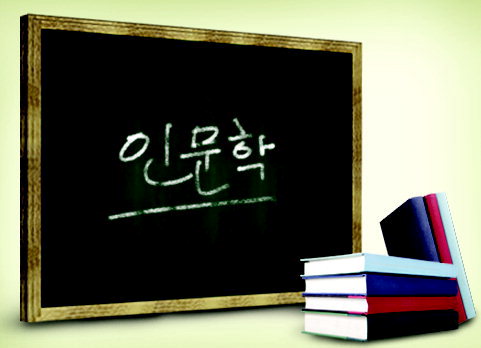
조강석(사진)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조교수는 22일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열린 인천시민인문학강좌에서 "일상은 인과의 연속이며 심연의 자궁이지만, 불행하게도 근대는 일상에서 인과를 계산하는 눈과 심연을 들여다보는 눈의 경계가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이창동 감독 영화 <시(詩)>와 일상의 윤리'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감독은 영화 첫 장면에서 일상과 심연의 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찔러두었다. 주인공 미자는 집으로 가는 길에 슈퍼마켓 주인에게 낮에 본 일에 대해 슬쩍 이야기를 꺼낸다.
강에서 투신해 숨진 여중생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서 슈퍼마켓 주인과 손님은 미자를 슬쩍 한 번 쳐다보고 다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렇다고 미자의 얘기를 안들은건 아니다.
조 교수는 "이 장면은 어쩌면 감독이 예술(시)을 생각하는 기본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 질서에 대한 개입과 교란을 한 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들의 시선이 슬퍼지는데까지 이끌리는 시선의 교차, 그것이 이 작품의 상징적 구도"라고 설명했다.
일상에서 주제넘는 일에 참견한다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인 일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미자. 미자는 '당신도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문학강좌 포스터를 보게 되고 여기서 '시'를 만난다.
시를 배우게 된 미자는 딸과 통화하면서 "내가 시인 기질이 좀 있지. 꽃도 좋아하고, 이상한 소리도 잘 하고…"라고 말한다. 이 생각은 통상 우리가 시와 시인에 대해 보이는 관습적 인식과 멀지 않다.
하지만 영화속 강사 김용탁 시인은 '본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일상적인 사물과 사건들을 시로 쓰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미자는 이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나 자연에 대해 새삼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메모한다.
영화 첫 장면에서 숨진 여중생은 손자의 성폭행때문에 죽음을 선택했음이 드러난다. 합의금이 필요한 미자는 병수발을 들던 노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500만원만 주세요'라고 메모지에 쓴다.
흥미로운 점은 미자가 평소 심연에 귀기울이며 적던 메모는 실상에서 아무런 효용이 없지만, 이 글은 갈등을 일거에 해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미자는 그러나 자신의 손자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금전적 합의 대신 인과적 보상, 즉 인과응보를 도모한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태가 '완전히' 진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기 위해선 또다른 보상이 필요했다.
평소 자신이 없어 메모지에만 글을 썼던 미자는 죽은 여중생을 위해 시 '아네스의 노래'를 쓴다. 이 시는 삶에 대한 미적 보상으로서의 예술의 의의를 보여준다.
시는 부박한 삶에 대한 거짓위안이 아닌 애도로써 기능한다. 조 교수는 "거짓위안과 합의금을 통한 보상 대신 시라는 애도를 통해 여중생의 삶이 완주되게 한다"며 "여중생이 시 내용처럼 자신을 기억하는 이를 축복하고 다시 꿈꿀 수 있었던 것은 시가 다녀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4번째 강좌는 11월 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허태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가 강사로 나와 영화 '최종병기 활'을 통해 병자호란을 재해석한다.
/김민재기자













![[2013 하반기 인천시민 인문학강좌·4] 영화 '최종병기 활'과 병자호란의 재해석](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311/781478_358837_54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