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2학년 고(故) 김모양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 등교하는 딸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던 시간이다. 하지만 하나뿐인 외동딸의 식사는 더 이상 챙겨줄 수 없다.
대신 어머니는 합동분향소로 달려가 딸의 영정을 보며 "밤새 잠은 잘 잤니"라고 묻는 게 일상이 됐다.
어머니는 일을 그만뒀다. 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부터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다. 낮 시간엔 주로 분향소에 있는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간 남편을 대신해 유가족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분향소 상황 탓에 온 가족이 이곳에 매달려 있다.
억울한 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김양의 어머니는 분향소 출입문에서 진행중인 '수습 및 진상규명 서명운동'을 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외치고 있다. 어머니는 "처음보다 눈에 띄게 서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눈물을 훔쳤다.
해가 져 집으로 돌아가도 김양의 어머니는 딸이 사용하던 방을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언제라도 딸이 '엄마' 하고 나올 것만 같은데 딸이 없는 휑한 방을 보고 싶지 않다.
세월호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일상에 복귀하지 못한 채 가족을 잃은 절망 속에 하루를 살고 있다.
고(故) 정모양의 아버지도 아침 일찍부터 분향소로 향한다. 딸의 영정 앞에 우두커니 서서 멍하니 바라보다 한참을 울고서야 분향소를 나선다. 딸 생각이 날 때마다 문자를 보내는 일이 그나마 마음을 위로하는 길이다.
정씨는 매일 "우리 딸 잘 지내지?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니?" "우리 딸 보고 싶구나.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단다" 등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문자로 보내고 있다.
정씨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를 잊어가는 것처럼, 언젠가 나도 우리딸 얼굴을 잊을까봐 너무 두렵다"며 "매일 밤 딸이 꿈에 나올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울먹였다.
/이재규·공지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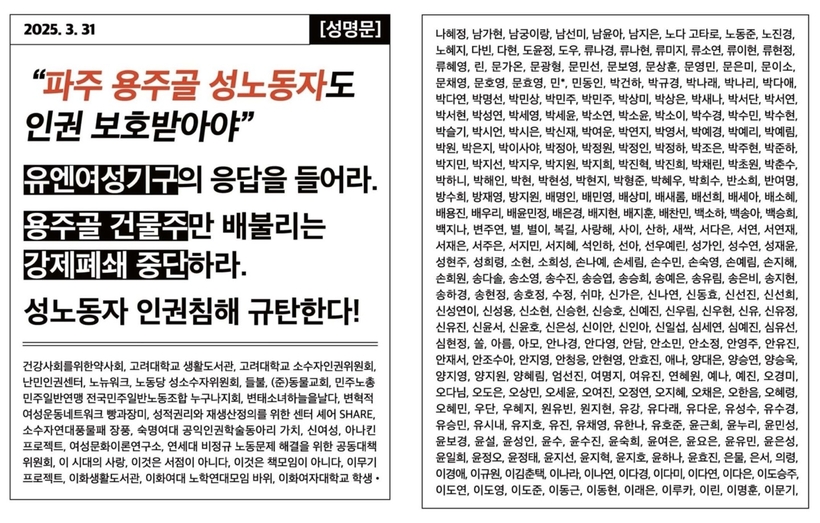






![[세월호 침몰]'조문객 급감 VS 실종자 남아' 분향소 폐쇄 논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5/858491_419582_5858.jpg)
![[세월호 침몰]'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정부 사과·책임자 문책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5/858492_419652_2650.jpeg)
![[세월호 침몰]여·야, 세월호 진상조사위 유가족 참여 합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5/858494_419620_1414.jpeg)
![[세월호 침몰]국회 세월호 참사 긴급현안질문](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5/858496_419584_5039.jpg)
![[세월호 침몰]일반인 희생자 7명 영정·위패 추가 제작 인천분향소 안치 이유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5/858520_419607_5929.jpg)
![[세월호 참사]실종자 가족에 악성 댓글 단 30대 불구속 입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5/858611_419692_2937.jpg)
![[세월호 참사]구원파 '검찰에 의해 명예회복 이뤄지면 금수원 수색 개방'](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5/858616_419694_43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