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선 '송두리째' 단어 보존
교동엔 평안도 말 섞이기도
체취 배어있는 말 영원할 것
사투리 혹은 시골말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방언은 서울말(표준어)이 아닌 말로 생각하기 쉬우나 학문적으로는 한국어를 이루는 하위의 모든 말을 뜻한다.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든, 어떤 집단에서 사용되든 그것이 한국어라면 방언이 되는 것이다. 서울에 인접한 인천에서 쓰는 말, 커다란 섬 강화에서 쓰는 말, 그리고 인천에 속한 50여 개의 유인도에서 쓰이는 모든 말이 방언이고 그 방언에는 고유의 특성이 배어 있다.
방언학자 한성우 인하대 교수는 지난 14일 열린 인천시민 인문학강좌에서 '언어 특징으로 본 인천 섬사람들'이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 땅의 모든 말이 방언이다"라고 강조했다.
'고립'의 상징인 섬은 언어 면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특성상 일단 언어적 특성이 형성되면 다른 언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독자적인 변화의 길을 걷는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강화지역에 남아있는 '송두리'란 단어이다. '송두리'는 사전에 '있는 것의 전부'라고 풀이되지만 '송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강화에서는 그것이 대나 싸리로 짠 바구니를 지칭하는 것으로 남아있어 '송두리째'의 의미를 명확히 알려준다.
비록 다른 지역에서는 이 단어가 사라졌을지라도 고립된 섬에서는 그 단어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 면에서 섬은 고립뿐 아니라 '도약'의 특성도 보여준다. 육지에서의 방언 전파는 동심원이 퍼져 나가듯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바다가 가로막힌 섬에서는 물길을 따라서 이뤄진다.
그 결과 물리적인 거리와는 관계없이 방언의 전파 양상이 나타난다. 교동 말에 나타나는 '어드렇게 왓어'는 전형적인 평안도 말이다. 허수아비를 뜻하는 영흥도 말 '쩡애'는 북부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말이다. 이러한 말들은 바닷길을 따라서 도약해 온 것이다.
언어의 고립과 도약은 궁극적으로는 '융합'으로 이어진다. 섬이 개척되기 시작하면 출신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속속 모여든다.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각자의 말이 섞여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말이 형성된다.
덕적도의 말이 그러하다. 지도상으로 보면 경기도와 충청도가 가깝고 말에서도 이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전형적인 황해도의 말이 관찰된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배를 부리던 황해도 사람들이 대거 남쪽 방향으로 내려와 덕적도에 자리를 잡은 까닭이다. 그 결과 덕적도의 말에 황해도의 말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고 있다.
한 교수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할수록 섬은 고립의 특성을 잃어가고 언어 또한 마찬가지이다"면서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말'이 방언인 이상 인천의 여러 섬에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체취가 배어 있는 말들이 지금도 쓰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5강은 10월 28일 오후2시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윤승준 인하대 교수가 '문명이 교차하는 바다 지중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김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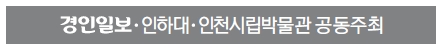













![[2014 하반기 인천시민 인문학 강좌·1]해양문화의 법고창신(法古創新)](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9/895065_456065_4644.jpg)
![[2014 하반기 인천시민 인문학 강좌·2]왕과 왕실가족 유배지 인천의 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9/898689_459646_2026.jpg)
![[2014 하반기 인천시민 인문학 강좌·3]해양인식의 확대와 해양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10/905604_467107_563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