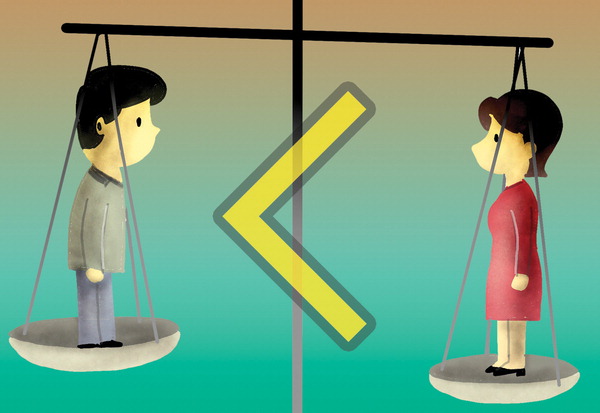
아들 선호사상은 한자 사용 유교문화권에서 심했다. 현 일본 왕실만 봐도 아키히토(明仁)왕의 부인은 미치코(美智子), 며느리는 마사코(雅子), 손녀딸은 ‘아이코(愛子)’로 ‘아들 子’자가 내리붙었듯이 아직도 일본인 여자 이름엔 ‘아들 子’자가 흔히 붙는다. 일본 지명(地名)조차 하치요지(八王子), 코요시(子吉), 코야스(子安), 코모치(子持), 코우라(子浦) 등 子자가 다수다. 중국엔 子씨라는 성씨가 다 있는가 하면 딸을 얻는 기쁨은 반쪽(半喜:빤시)에 불과하니 다음엔 꼭 아들을 낳으라는 뜻으로 여자를 ‘女子子’로도 불렀다.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아들을 무시하듯이 ‘子’자가 단어의 접미사로 마구 쓰인다. 사자(獅子)에만 子자가 붙는 게 아니라 토끼(兎子)에도, 원숭이에도 붙고 심지어 입(口子)에도, 코(鼻子)에도 붙는다. ‘코아들’이 아니라 그냥 ‘코’라는 뜻이 ‘鼻子’다. 남존(男尊)과 남비(男卑)의 희극적인 혼재(混在)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남녀 성비가 1990년의 116.5대100에서 거의 같아졌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점점 ‘여아 선호’로 가는 건 아닐까. 아랍권에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이 완고한 건 문명개화와 사상 진화가 덜 된 탓이다.
/오동환 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