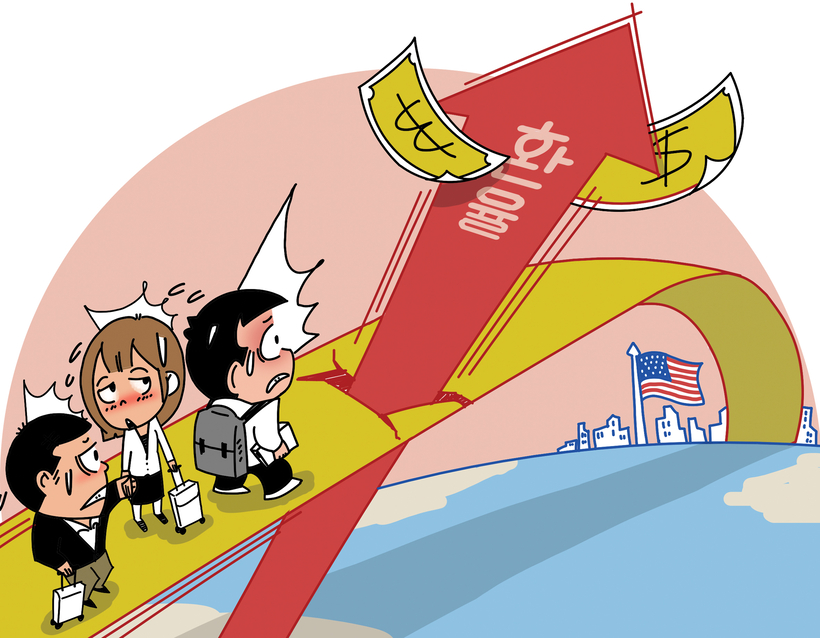이제 우리사회 '고졸출신 名匠 신화' 꿈꿀수 없어
정부·국회 침묵하지말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던 지난 1980년대 초반 시골 중학교 3학년에 다니던 친구가 금오공고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진심 어린 축하인사가 꽤 오랫동안 이어졌던 기억이 새롭다. 평소 손재주는커녕 "모든 게 저 아이 손에 가면 깨지고 망가진다"며 퉁바리 얻어맞기 일쑤던 필자에게 그 친구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의욕을 보인다고 손재주 없는 필자가 기술계 학교(현재의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한다는 건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다. 그저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문제 하나 더 잘 풀어서 인문계 고교에 진학한 뒤 뭘 전공할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막연하게 대학에 가겠다는 어설픈 청사진을 그려보는 게 전부였다.
486세대들은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거라 짐작해본다. 상업계 고등학교에 간 친구는 필자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이 끝나갈 무렵 우연히 만났을 때 당시 내로라하는 은행에 사실상 취업을 확정 짓고 현장실습을 나간다는 말에 "소위 일류대학을 갈 정도로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닌데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하는 자괴감까지 들기도 했다. 순간 부모님에게 미안도 했고, 한동안 혼자만의 깊은 시름에 빠지기도 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회의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전문 기능인 또는 장인(匠人)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술계 및 상업계 고교 졸업자들이 조기 취업에 남부러운 영광을 안고 입사한 이후 소위 대학졸업장이 없어 승진에 누락되거나 호봉체계 틀 자체가 달라 임금 차별을 받는 현실이었다. 궁여지책 야간대학이나 방송통신대에 입학해 스펙용 졸업장을 따내려는 눈물겨운 회사생활을 감당하는 현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런 대한민국의 비뚤어진 단순 학력 위주의 사회문화는 결국 미래의 '기술 한국'을 이끌어 갈 우수한 잠재인력들을 꿈조차 꿀 수 없도록 좌절시켰다. 고졸 출신 명장(名匠)이라는 신화가 우리사회에 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독일의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한 마이스터고가 탄생했다. 마이스터(Meister)는 '선생님'이라는 뜻의 라틴어 magister 에서 유래됐다. 중세 유럽 길드(GUILD)제도로부터 이어져 오다 독일의 직업 훈련 제도로 1969년에 만들어졌다. 길드에는 엄격한 '견습공→도제→마이스터'라는 계층질서가 존재했고, 마이스터만이 문서화 된 자격증을 가질 수 있었다. 견습공들은 대부분 마이스터에게 수업료를 지불하고, 상당한 실습기간을 거쳐 길드에 가입했다. 견습생은 전문시험을 거쳐 도제사회로 편입되었고, 이 시험이 중세의 자격시험, 오늘날 기능사 자격의 원조격이다.
경인일보는 2016년 현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실상을 짚어봤다. 고졸 명장의 꿈을 안고 입학한 이들 기술계 학생들의 현실은 기가 막힐 정도로 처참했다. 학교와 학생, 현장실습 업체 등 3주체간의 관계는 갑과 을이 엄격히 존재했고, 학생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현장실습 교육권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표준협약서를 작성토록 한 법은 있으나마나했고,전공과 무관한 열악한 노동현장에 실습학생들을 마구잡이로 내몰고 있었으며 이를 알고도 학교는 정부 지원금을 타먹기 위해 취업률에 목을 매 학생들에게 반성문까지 쓰게 할 정도로 버티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기술 대한민국의 밀알들이 완전 썩어가고 있었다.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대대적인 수술이 즉각 이뤄져야 하고 국회에서도 특별법 발의를 통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 불·탈법 근로현장에서 숨죽이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일이 급선무다.
/김성규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