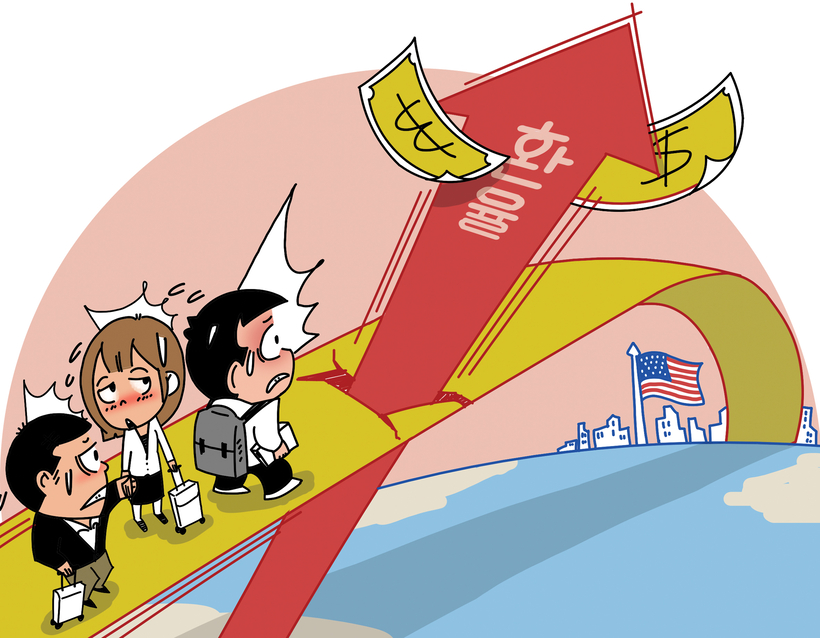결과는 다행이었지만, 알고 보니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선별 진료소가 아닌 곳으로 의심환자가 이송되고, 보건소와 대학 병원 의료진 간 실랑이 끝에 진료가 시작됐다. 환자는 1차 진료에서 폐렴이 의심됐지만, 국가 지정 병원에선 폐렴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 어수선했고, 곳곳에서 허둥지둥한 흔적이 보였다. 만약 그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일반 환자들의 외래 진료가 있는 평일 낮,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병원으로 의심환자를 이송했던 보건소의 판단은 되돌아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유일한 선별진료소였던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으로 의심환자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해당 환자는 우한이 아닌 곳에서 온 중국인으로, 당시 매뉴얼상 의심환자 범주에 들지 않았다. (민간병원에서) 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한은 아니었지만, 중국 다롄에서 온 환자였다.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질환이 있었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환자 이송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터다.
확진환자 1명이 발생하면 그와 접촉한 사람들이 모두 격리 관찰의 대상이 된다. 그 환자의 동선을 지났던 시민들은 물론 지역 사회가 불안에 떤다. 선별 진료소였던 도립의료원 의료진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를 차치하고도, 하루에 수천 명이 드나드는 대학병원에 갑자기 의심 환자를 데려간 것은 무모하고도 안일한 선택이었다.
지금은 정부가 정한 의심환자 판단 기준이 확대되고 시에 선별 진료소도 늘어나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은 매뉴얼을 겨우 지키는 수준이 아닌, 선제적 예방 대응을 보건당국에 기대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