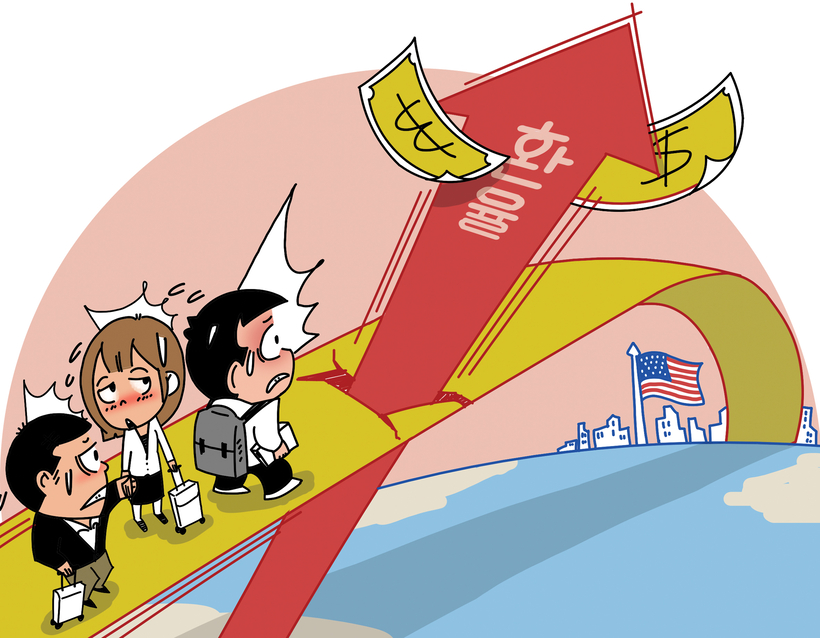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사무실이기도 한 카페 차차에는 새벽마다 회사로 돌아온 해고자들이 모였다. 10년 만의 출근을 앞둔 흥성거림 속에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해 속을 끓이는 모습이 보였다.
누구보다 이들과 가까웠을 수 있는 지역언론이지만, 지난 10년간 제대로 쌍용차와 해고자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부채의식에 1월 한 달을 평택에서 보냈다. 해고 복직자를 시작으로 평택시청, 평택시민사회, 평택주민, 쌍용차의 명예 퇴직자, 쌍용차 직원, 쌍용차 연구자를 두루 만났다. 노동자와 회사라는 고정된 틀이 아니라 평택과 지역의 눈으로 쌍용차 그리고 해고자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희망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더 큰 어둠을 만났다.
해고 복직자가 회사로 돌아온 2020년, 쌍용차는 10년 전보다 더 큰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다. 취재하고, 기사를 쓰며 기자가 희망과 해법이 아니라 어둠과 불안을 얘기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고민했다.
그래서 탄생한 기획물이 지난주 출고된 '희망의 그늘, 쌍용차 그리고 평택'(2월12·13·14일 2판 보도)이다. 취재를 통해 발견한 것은 '희망 없음'이었지만, 그래도 언론인으로서 사회와 독자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강박이 컸다. 한국GM 공장이 철수한 전라북도 군산을 찾아갔고, 세종시와 서울시를 오가며 우리에게 해답을 내려줄 사람들을 만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탈출구는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 우려가 큰 건, 10년 전 '쌍용차 사태'의 아픔 때문이다.
모쪼록 다가온 위기와 다가올 어려움 속에 우리 사회와 쌍용차 그리고 지역사회가 지난 10년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을 솔루션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솔루션 저널리즘'에 노력했지만 취재팀은 확실한 답을 드리지 못했다. 해법을 찾는 긴 여정에 우리의 기사가 조그만 촛불이라도 되길 기원한다.
/신지영 정치부 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