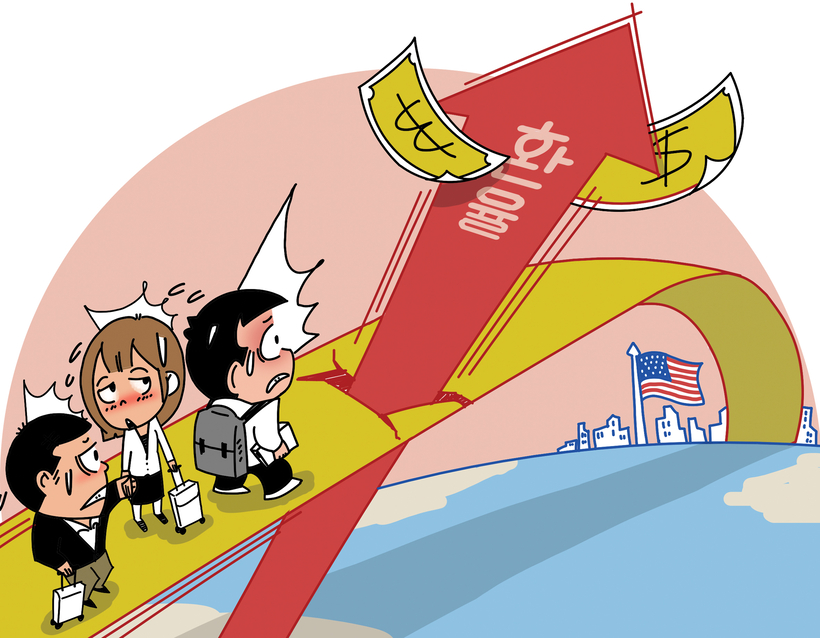존재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다. 법무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부른다.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들은 미등록외국인 혹은 미등록노동자라고 부른다.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 더 초점을 맞춘 표현이다. UN에서도 미등록 비정규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권고하고 있다. 불체자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범죄자를 떠올리게 되지만, 미등록외국인이라고 하면 시무룩한 약자가 떠오른다.
지난 10일 오후 존재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외국인을 만났다. '부바'스러웠다. 미등록외국인 체불임금 사건을 맡은 노무사로부터 '경찰 협박. 전화 주삼'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갔더니 마스크를 쓰고 후드를 뒤집어쓴 채 겁에 질린 태국 국적 미등록외국인 녹씨가 앉아 있었다. 로비에는 지역경찰관 2명이 '불체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와 있었다. 협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미등록외국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범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이 외국인의 신분을 알았다고 해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는 제도가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다. 이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근로기준법이 빠져있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으며 자동차 부품을 만든 미등록 외국인은 보호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었다. 노동의 대가는 소중하다. 미등록외국인의 임금도 마찬가지다. 녹씨가 일한 공장 사장에게 미등록외국인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 KBS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가 떠오른다. "사장님 나빠요."
/손성배 사회부 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