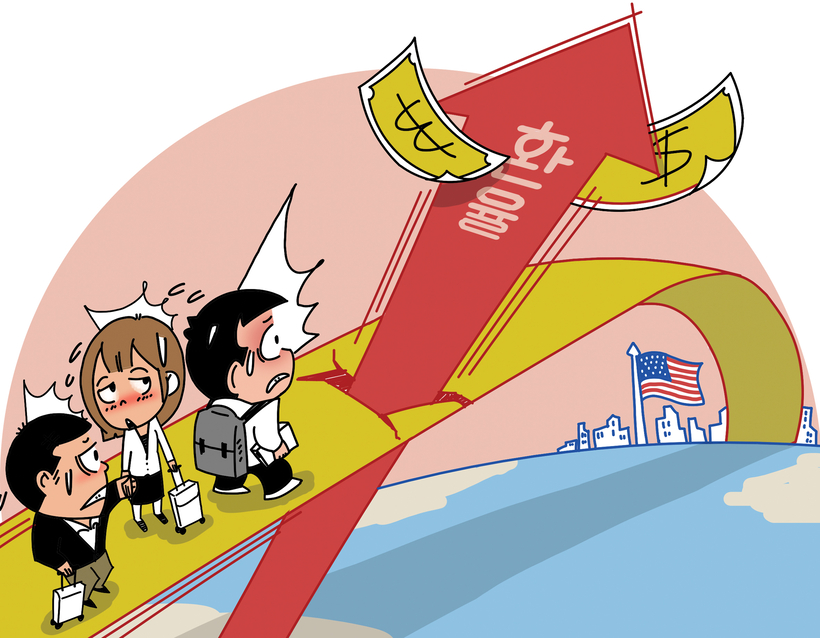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끝이 아니었다. 참사 이후 6년이란 시간 동안 2차 피해는 늘어갔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단원고 희생자의 아버지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그들은 먼저 떠난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생전에 더 잘해주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앞선 2016년에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민간잠수사 김관홍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20년 4월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배가 침몰하는 모습을, 구조되지 못한 수백 명의 승객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본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누군가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함은 이미 2014년 4월16일 경험했다. 또다시 죽음을 방치하는 건 무기력이 아닌 무책임일 뿐이다.
각자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지겹다'고 말하는 유가족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한 경향이 있다. 유가족과 인터뷰 기반의 연구를 진행한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남은 가족들의 트라우마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운이 없어 죽은 걸로 만든 국가에 대한 좌절감이 생각보다 컸다"고 지적했다. 트라우마가 어디에서 왔는지, 본격적인 트라우마가 발현되기나 한 건지 우리 사회는 제대로 고민한 적이 없다.
'공감 격차', 말 그대로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다. 이젠 추가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누군가의 죽음은 그 자체로도 지겨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배재흥 정치부 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