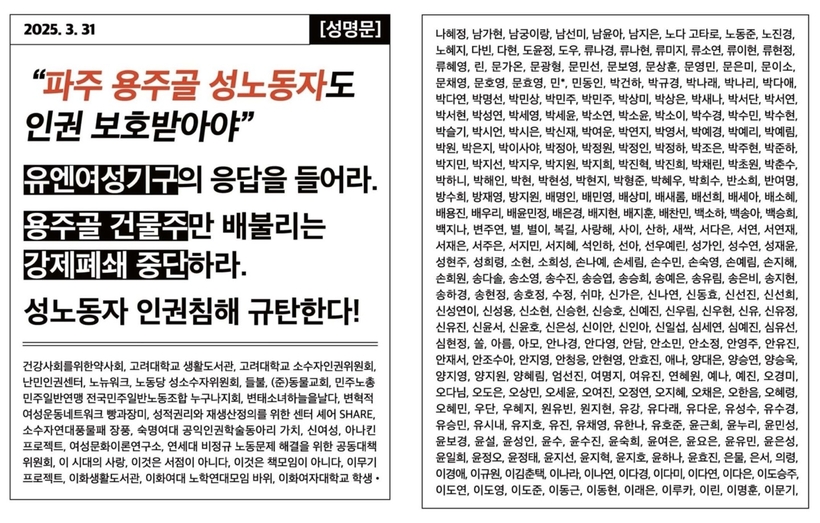시작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무심코 대리기사와 나눈 대화였다. 대리기사만 타는 셔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만의 밤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됐다.
마음먹고 들여다본 대리기사의 삶은 고단하고 애처로웠다. 1만원 대리비에서 중개업체 수수료와 프로그램 이용료, 보험료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단돈 몇 천원. 500원짜리 어묵으로 밤새 끼니를 대신하고 한참을 기다리다 받은 콜이 취소될까봐 종종걸음 해야 하는 일상. 사랑방 역할을 하는 어묵 가판대에서 대리기사들에게 들은 각종 이상한 손님 후일담은 웃음이 나면서도 짠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수요는 대폭 줄어든 반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이들이 대리기사로 몰리면서 점점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움을 더했다.
큰 틀에서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사회적 안전 분야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대리기사들은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좁은 차 안에서 짧게는 30여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 취객과 함께 있어야 해 코로나19 전염 위험이 큰 데도 정부의 보호장구 지원 대상에 빠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리기사가 타는 불법 셔틀도 수년간 존재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그동안 없었다. 기사에 다루지는 않았으나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개 프로그램 제공업체의 갑질 등 점점 악화되는 대리기사 노동환경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엔 약 20만명의 대리기사가 있다. 밤에 일하는 직업 특성상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직업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특수 직종 종사자가 처한 환경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 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