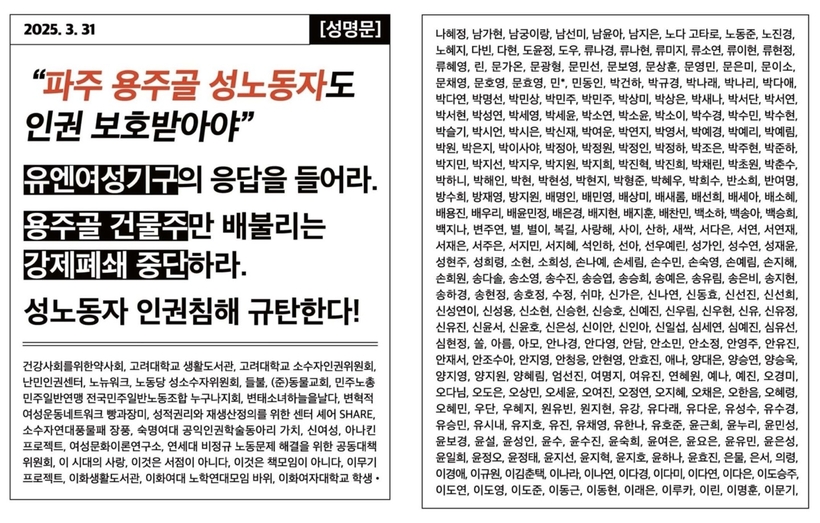대체로 '한'(恨)에 대한 말이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들을 때면 가끔은 가슴이 울렁이는 기분을 느끼곤 했다. 건조한 숫자만 펼쳐지는 수리 시간보다 역사 수업이 더 뜨겁게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근현대사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왔다. 외울 필요없이 사건이 기억 속으로 박혀 들었다. 때는 참여정부 시절이었고, TV속 뉴스에선 '역사 바로 세우기', '양민 학살의 진실', '유해 발굴 개시' 같은 헤드라인이 지나갔던 것 같다.
뜨거웠던 근현대사 선생님도 한국전쟁을 설명할 땐 말 대신 칠판 위에 화살표를 그렸다. 6월25일 갑자기 남침이 이뤄졌고(화살표는 아래로 향한다), 낙동강까지 밀렸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화살표는 위로 향한다), 중공군이 개입해 압록강부터 3·8선까지 전선이 밀린다(화살표는 다시 아래로 향한다). 그러다 정전이 이뤄졌다. 초등학생 때부터 봐왔던 익숙한 전개도였다.
얼마 전 한국전쟁 당시 일기를 보게 됐다. 국민방위군 사건 기록이었다. 근현대사 선생님의 수업에서도, 미디어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다.
전쟁 중 정부는 급히 국민방위군을 모집했고, 이들에게 피복과 보급을 주지 않았고,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굶거나 얼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어갔다.
일기를 읽으며 고등학교 졸업 십수 년 만에 다시 그 시절 교실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다. 문득문득 응어리처럼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우리에겐 한국전쟁의 가장 큰 인권탄압 사건인 국민방위군 사건을 사과하고 교육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늦은' 역사는 없다. '국민방위군'을 기억하라.
/신지영 경제부 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