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등 신청받는 공공기관
담당자조차 관련법·용어 잘몰라
처지 설명에 잇단 비아냥 '자괴감'
전세대출 등 정보 얻기도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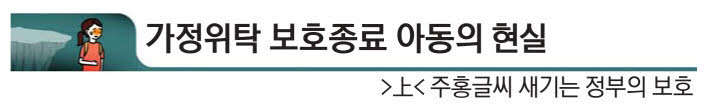
"보호종료아동이요? 보호자인가요?"
부모의 이혼으로 고모 손에서 자란 김진아(24·가명)씨는 만 18세 이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정위탁 보호아동'이었다. 대학 진학 후 '보호연장아동'이었다. 졸업 후 '보호종료아동'이 된 김씨는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다 진땀을 뺐다.
김씨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말하자 아동을 찾으며 보호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가정위탁된 보호아동이었고, 이제 보호종료가 됐다는 것,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명칭이 돼 있다는 설명을 공무원에게 구구절절해야 했다. 그럼에도 가족이 있는데, 왜 보호를 해야 하는지 잘 이해 못해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부모의 사망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박희철(25·가명)씨는 군대에 있는 동안 끊어진 기초생활수급비를 제대 후 재신청하기 위해 구청을 갔다 봉변을 당했다. 대학 복학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와 생활비 등을 벌었지만 다쳐도 병원에 가지 못할 만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수급비를 재신청하려 했는데, "장애인이냐, 사지가 멀쩡한데 왜 수급을 신청하느냐"는 공무원의 비아냥을 들었다. 박씨는 "보호아동이었고, 지금은 연장아동이라는 걸 계속 설명하는데 자괴감을 느꼈다"고 씁쓸해했다.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종료를 맞는 경기도내 청년들의 수는 2018년 기준 200명이다. 보육원 등 시설에서 자라 보호종료아동이 된 청년들이 119명인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많다.
특히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면 위탁을 맡은 보호자가 '보호아동'을 신청해야 공공 복지체계에 잡히기 때문에 그 수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가정위탁아동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명목상 조손, 친인척 등의 보호를 받는 가정위탁아동들은 청년이 된 후 자립과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해야 하는 신세다. 국가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을 통해 마련한 '자립수당' 등을 신청할 때조차 '부모 없는 아이'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정부가 보호종료아동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LH의 청년전세자금대출 등도 이들에겐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다.
큰아버지 손에 자란 김유정(25)씨는 "보육원에서 성장한 친구들은 퇴소와 동시에 세대주 자격이 부여돼 신청만 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세대주가 가정위탁 보호자로 돼 있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 자격을 획득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걸 전혀 몰랐다. 그래서 어렵게 6개월 가량 월세를 얻어 생활했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조사한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시설 보호종료아동들은 LH 거주 비율이 45%지만, 가정위탁의 경우 19%로 가장 낮았다.
이들은 휴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김진아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1년 휴학을 신청하려다 포기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는데, 휴학을 하면 3개월 후부터는 '보호중지'가 돼 수급비가 끊긴다고 했다. 수급비를 계속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준비를 하며 자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며 "졸업 후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다. 꿈도 마음대로 꿀 수 없는 것이 슬프다"고 한숨지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jy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