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 가정은 부양부담도 짊어져
정부 지원 신청땐 '기생충' 조롱
"열심히 사는 것마저 질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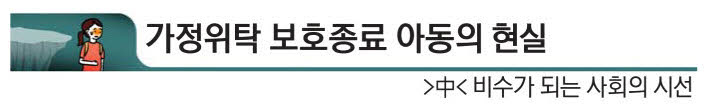
"나가."
김유정(25·가명)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가 많은 친척의 집에 위탁됐다. 그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나가"라는 것이다.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친척의 형편상 얹혀서 살다시피 했는데, 친척의 자녀들이 "나가"라고 말하면 속절없이 집 밖으로 나가 모두 잠이 들 때까지 밖을 떠돌아다녔다.
김씨는 "우리는 정말로 갈 곳이 없다. 보호아동일 때도, 보호가 종료된 지금도 '나가'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마음이 힘들다"고 말했다.
가정에 위탁된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정서적 스트레스는 상당하다. 특히 이들을 향해 위탁가정, 학교, 사회가 쏟아내는 편견에 가득한 말은 '비수'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특히 만 18세 이후 위탁된 가정에서 '자립'을 강요당하면서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조손가정에서 자란 이들은 부양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박민주(21·가명)씨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보호종료아동이다. 최근 박씨의 할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 아직 증상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치매를 겪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박씨는 "할머니 손에 자랐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지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할머니의) 다른 자녀들은 뾰족한 수가 없으니 지켜보자고만 한다. 병원을 모시고 가거나 치료받는 일 등을 도맡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연장아동인 김민철(23·가명)씨도 지난 1월 보호자인 할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아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내가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변에서 '은혜 갚아라' '남의 자식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는 등 말을 많이 해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보호연장아동의 자격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보호종료가 되면 자립수당을 받는 등 자립 기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선에 시달려야 한다.
김민철씨는 부양 부담, 생활고 등을 주변에 이야기했을 때 "'나라 좋아졌다' '기생충'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털어놨다. 세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장래희망을 갖는 일도 접게 했다.
김씨는 "중학교 때 진로를 상담한 선생님은 뭘 하고 싶냐고 묻지 않았다. '할머니 모셔야 하니까 안정된 직장 가져야지' 라며 당연하게 실업계고를 권했고 나 역시 막연히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대학은 생각도 못한 채 실업계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김유정씨는 "우리가 잘못해서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망한 것이 아닌데도 사회는 우리에게 키워주면 감사해야 하는 사람, 은혜를 갚아야 하는 사람, 기본적인 욕구 외에는 포기하는 게 당연한 사람처럼 인식한다"며 "'넌 왜 이렇게 전투하듯이 사냐' '너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도 사력을 다해 살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보단 편안했을까 생각했다. 열심히 사는 것마저 질타의 대상이 된다는 게 서글프다"고 말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jyg@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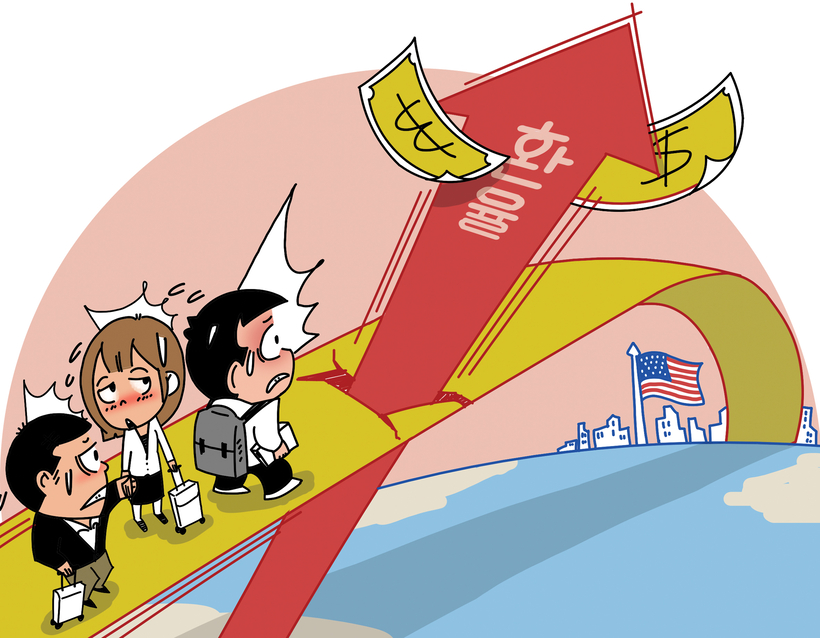









지금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