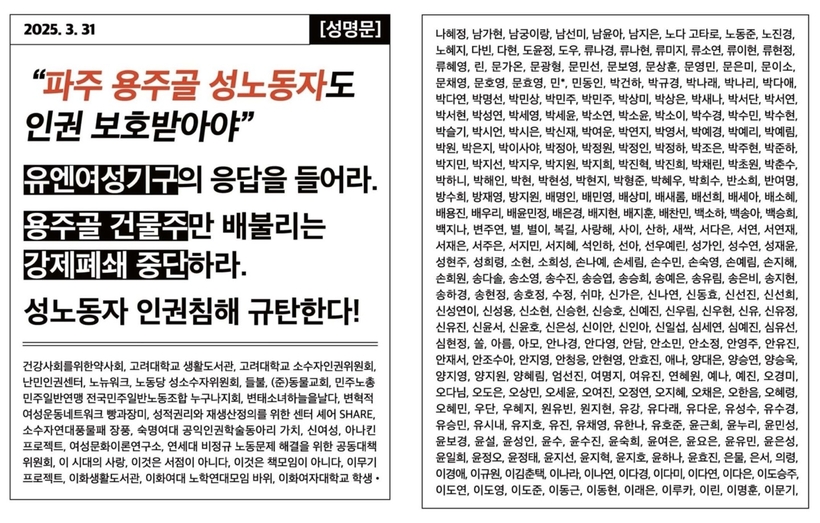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한 배움터지킴이의 하소연이다. 배움터지킴이는 각급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외부인에 대한 발열 체크까지 도맡으면서 학교 운영의 필수 인력이 됐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원봉사자'다. 배움터지킴이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하는 일이 많아졌으니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 배움터지킴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이들이 하루 8시간을 일해 받는 돈은 4만원 수준이다. 그마저도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는다면 4만원에서 식비가 차감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다 보니 최저 시급도 무용지물이었다. 인천에 있는 524개 초·중·고등·특수학교 중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곳은 10여 곳에 불과하다.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인질극 사건이 떠올랐다. 20대 남성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며 교무실까지 들어가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위협한 사건인데, 배움터지킴이가 없어진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져 이 같은 일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교육청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분명 다른 형태의 인력을 고용해 배움터지킴이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다.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자원봉사자로 시작했을지라도 필수 인력이 된 이들을 영원히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인천시교육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배움터지킴이 신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