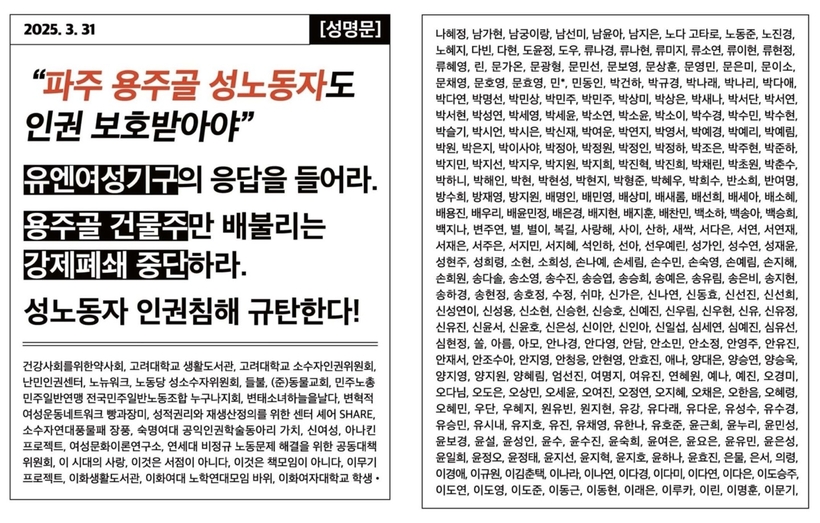매출이 떨어져 생계가 막막한 데 통신비 지원이 웬 말이냐 라든가, 차라리 도산이나 폐업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도우라는 등 세금 낭비란 지적이 대부분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인센티브를 15% 추가 지급해 민생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충전하고 사용할 때 받는 인센티브 2만원에 3만원을 추가로 얹어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지원을 통한 수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목표로 해 정부의 통신비 지급 정책보다는 긍정적 여론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금성 복지정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지난 1차에 이은 정부의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물론 지방채를 통한 지자체의 지원금 등으로 국가 채무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지갑이 쪼그라들고 당장 먹고살기 힘들어진 국민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현금을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물론 불어난 국가 채무가 나중에 심각한 재정 악화를 불러오거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해도 국민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정부는 당장 짧은 기간 동안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다 주는 현금성 정책이 장기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과도한 투입으로 인해 향후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경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준석 경제부 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