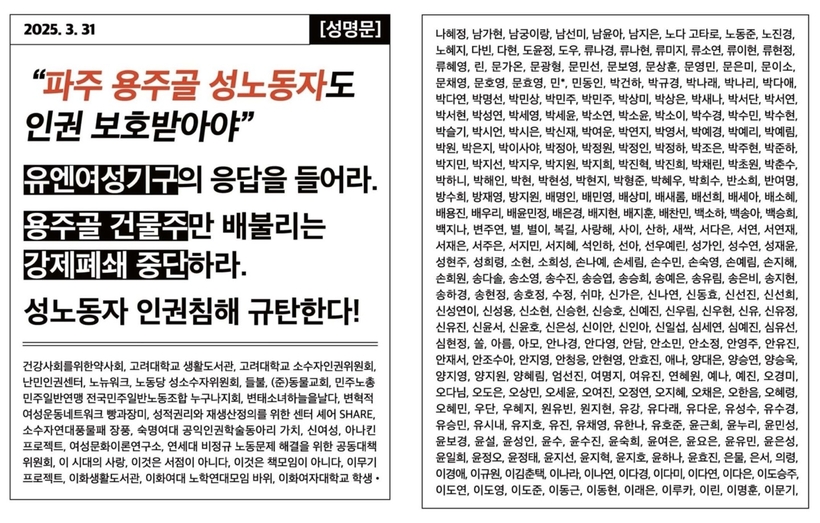하지만 요즘 세상엔 남 일에 관심 두는 이웃이 흔치 않을뿐더러, 관심을 둬도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우리 사회엔 '남의 집 일에 참견하는 건 미덕이 아니다'라는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 아동학대 역시 한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크다. '라면 화재' 형제처럼 한부모 가정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면 "양육자가 힘든 처지에 있으니 애들만 남겨 둘 수도 있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게 아동보호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 이후 방임을 아동학대의 연장선에서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방임이 확인된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후'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사고 역시 위기를 알아챘던 주민들의 노력으로 기관에서 나섰으나 이처럼 주변 관심에 기대어 방임사례를 찾는 건 흔치 않다.
한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방임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임은 기관·사람에 따라 정의가 다르고 판단 기준도 구체적이지 않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홀로 남겨진 아동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들이 '맹탕'에 그치지 않도록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데 적극 힘써야 하는 이유다.
/박현주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