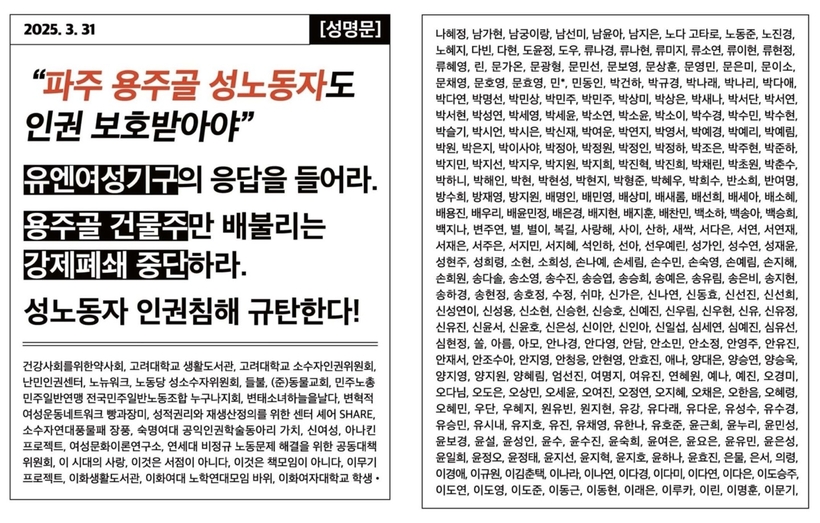기자는 약자고, 언론사도 당한다. 동료가 지난해 소송을 당했다. 손해배상액은 '억'대다. 소장을 받은 날, 편집국 분위기는 술렁였다. 언론사의 그 누구도 억대 소송에 의연할 사람은 없었다.
2019년 8월 22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다. 같은 해 9월 2일, 피고인인 기자들에게 전달돼야 할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는 '수취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도착하지 않았다. 9월 23일 다시 배달이 시작된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도 '수취인 불명'으로 도착하지 않았다.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가 도착한 건 10월 17일에서다. 더 큰 문제는 변론 없이 선고하겠다는 법원의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가 11월 29일 '주소불명'이라는 이유로 또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법원은 12월 11일 '송달간주'로 무변론 선고한다. 1심 결과는 피고(기자) 패, 원고 승.
이 모든 기간 동안 동료들은 경인일보에서 매일 같이 일간지를 만들고 있었다.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랄까. 변론 한 번 못 해보고 기자가, 언론사가 당했다.
소송을 당한 기자는 "소장이 도착한 뒤엔 나머지 서류 도착을 확인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라며 자신의 부주의를 탓한다. 소송을 당한 문제의 기사를 쓴 이유도, 자신의 부주의를 탓했던 그 기자와 동료들의 성품 때문이다.
불의를 외면하지 못하는 것. 오로지 '공익'이라는 무기만 지녔다는 게 그의 (잠정적)유죄 사유다. 언론사도 이렇게 당하는 데, 세상엔 얼마나 많은 사법 피해자들이 존재할까. 등골이 서늘하다.
/신지영 경제부 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