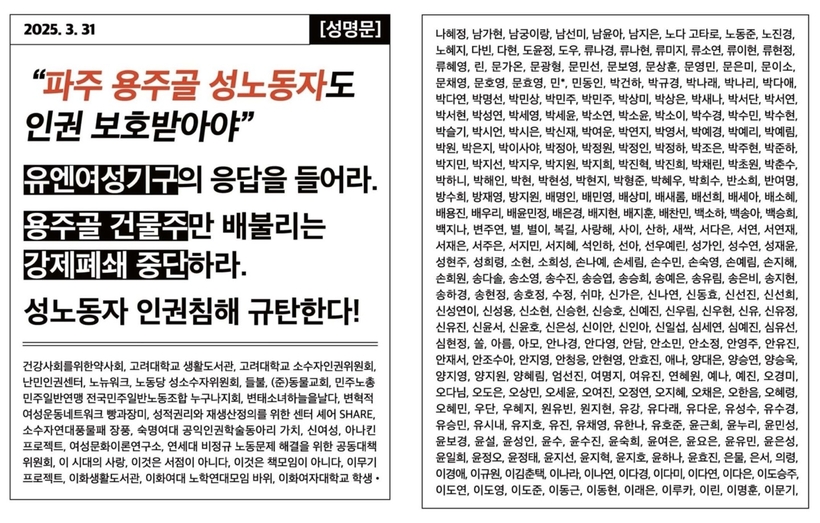기자가 되고 몇 해가 지나 그 은행 전·현직 임원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는 뉴스를 들었다. 고위 관료나 기업체 자제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식으로 채용을 도왔다는 내용이었다. 기자가 되고 나서 이른바 '낙하산'이란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사석에선 형·동생·누나·친구로 호명할 정도로 가까워진 '낙하산'도 여럿이다. 과거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주요 코스다. 허들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꽂고, 몇 년이 지나 자연스럽게 정규직이 된다. 어떤 '낙하산'은 그 어떤 '비낙하산'보다 열심이었다. 기자인 나에게도, 같은 회사 직원에게도 정성을 들였는데 어디 가서 누구 백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였는지 능력도 탁월했다. 형·동생·누나·친구가 된 낙하산들과 어울리다 보면 가끔 헷갈린다. 입직 경로는 다양할수록 좋고, 낙하산도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서류-필기-면접을 거친 공채보다 때론 낙하산이 더 나은 인재일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그럴 때마다 저 날의 기억을 떠올린다. '지원자 신지영'이 '기자 신지영'에게 말한다. 정신 차리라고. 정과 정의를 구분하라고. 그 날의 기억을 잊지 말라고.
/신지영 경제부 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