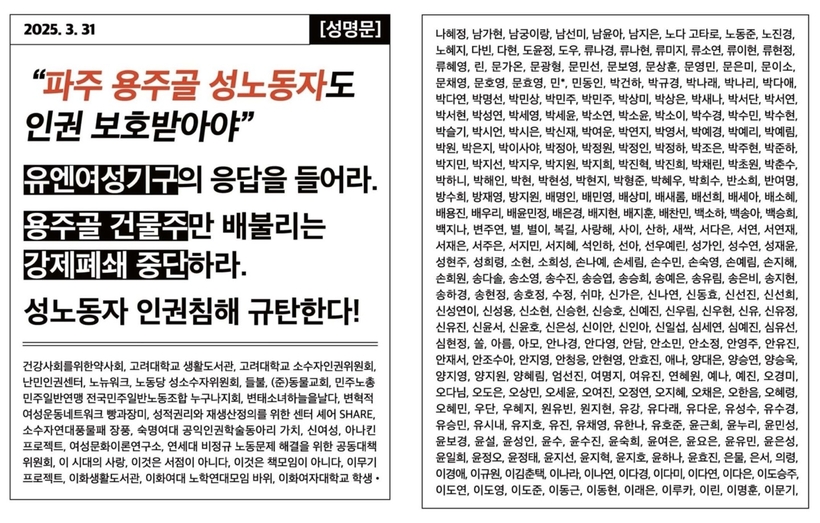스마트폰을 '붙잡고' 사는 경기도 중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1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학교와 학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아이들의 유일한 낙이 된 셈인데, '5시간 이상' 장시간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돼 교육당국의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 내 107개 중학교의 1학년과 3학년 학생 5천91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하루평균 목적별 디지털기기 이용 시간 변화를 조사해 살펴본 결과, 목적별로 유의미한 변화양상이 눈에 띄었다.
특히 여가생활을 위해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대폭 늘어난 반면, 교우관계 등 친목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주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음악을 듣거나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을 보는 여가활동 시간은 코로나19 이전(2018년)은 하루 평균 1~2시간(남녀 학생 각각 49.2%, 40.4%)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평균 1시간 미만(남녀 각각 22%, 26.1%) 디지털기기로 여가를 보낸다고 응답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인 지난해 조사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하루평균 3~4시간 동안 디지털기기로 여가를 보낸다는 남녀 학생 응답률이 각각 36.6%, 35.2%로 가장 높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시간 이상 본다는 응답률의 변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5시간 이상 응답률이 남녀 각각 6.9%, 5.4%로 매우 낮았지만, 코로나19 이후 5시간 이상 디지털기기로 여가를 보낸다는 응답률이 남녀 각각 19%, 25.3%로 코로나19 이전보다 '5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변화는 지역별, 성적별로 세분화했을 때 극심한 편차가 드러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내 농촌 지역 중학생들의 경우 3~5시간 이용률은 65.9%로 도시지역 학생(56.6%)보다 10%p 가까이 높았다. 이 중 5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비율은 농촌지역 학생들이 30.6%로 월등히 높았는데, 학원을 비롯해 청소년 여가시설이 없거나 열악한 농촌의 지역적 한계가 재난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성적별로 비교했을 땐 5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하위권 학생들이었다. 코로나19 이전 12%였던 하위권 응답비율은 코로나19 이후 37.6%로 급증했다. 상위권(14.8%), 중위권(22.9%)와 비교해도 확연히 높은 수치 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친목활동' 이다. 여가활동과 달리 소폭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친목을 위해 디지털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점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남녀 학생 각각 4.9%, 1.3% 였던 반면, 코로나19 이후 19.1%, 10.4%로 5배에서 10배 가까이 친목을 위해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조치 등 강력한 방역 조치로 학교, 학원을 비롯해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들이 문을 닫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연구를 진행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코로나 19 이전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고 서로 도우며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해 이해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학습할 기회가 있었다면, 코로나19 이후 학교에서의 대면 상호작용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며 "비대면 수업에선 미래핵심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업능력 신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학교와 학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아이들의 유일한 낙이 된 셈인데, '5시간 이상' 장시간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돼 교육당국의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 내 107개 중학교의 1학년과 3학년 학생 5천91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하루평균 목적별 디지털기기 이용 시간 변화를 조사해 살펴본 결과, 목적별로 유의미한 변화양상이 눈에 띄었다.
특히 여가생활을 위해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대폭 늘어난 반면, 교우관계 등 친목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주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음악을 듣거나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을 보는 여가활동 시간은 코로나19 이전(2018년)은 하루 평균 1~2시간(남녀 학생 각각 49.2%, 40.4%)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평균 1시간 미만(남녀 각각 22%, 26.1%) 디지털기기로 여가를 보낸다고 응답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인 지난해 조사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하루평균 3~4시간 동안 디지털기기로 여가를 보낸다는 남녀 학생 응답률이 각각 36.6%, 35.2%로 가장 높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시간 이상 본다는 응답률의 변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5시간 이상 응답률이 남녀 각각 6.9%, 5.4%로 매우 낮았지만, 코로나19 이후 5시간 이상 디지털기기로 여가를 보낸다는 응답률이 남녀 각각 19%, 25.3%로 코로나19 이전보다 '5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변화는 지역별, 성적별로 세분화했을 때 극심한 편차가 드러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내 농촌 지역 중학생들의 경우 3~5시간 이용률은 65.9%로 도시지역 학생(56.6%)보다 10%p 가까이 높았다. 이 중 5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비율은 농촌지역 학생들이 30.6%로 월등히 높았는데, 학원을 비롯해 청소년 여가시설이 없거나 열악한 농촌의 지역적 한계가 재난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성적별로 비교했을 땐 5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하위권 학생들이었다. 코로나19 이전 12%였던 하위권 응답비율은 코로나19 이후 37.6%로 급증했다. 상위권(14.8%), 중위권(22.9%)와 비교해도 확연히 높은 수치 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친목활동' 이다. 여가활동과 달리 소폭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친목을 위해 디지털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점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남녀 학생 각각 4.9%, 1.3% 였던 반면, 코로나19 이후 19.1%, 10.4%로 5배에서 10배 가까이 친목을 위해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조치 등 강력한 방역 조치로 학교, 학원을 비롯해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들이 문을 닫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연구를 진행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코로나 19 이전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고 서로 도우며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해 이해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학습할 기회가 있었다면, 코로나19 이후 학교에서의 대면 상호작용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며 "비대면 수업에선 미래핵심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업능력 신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