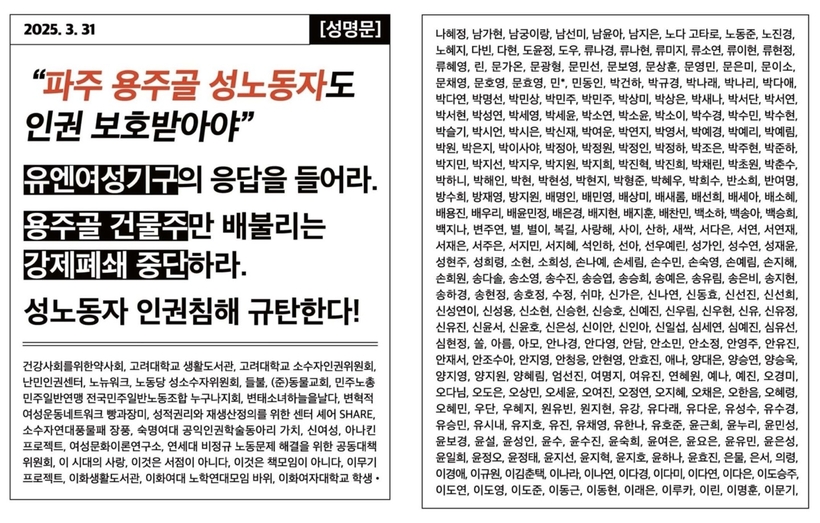전문가들은 이미 공유자전거가 버스, 지하철과 같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고, 공유자전거로 파생된 경제·사회적 효과를 무시해선 안된다며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안산 고잔동 호수공원 인근. 기자가 직접 '카카오T' 어플을 켰다. 서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3대의 '카카오T 바이크' 자전거가 화면에 잡혔다.
그중 가장 가까운 곳의 자전거를 하나 골라, 정차 위치로 향했다. 과거 카카오 택시나 대리를 이용하며 등록해둔 자동결제 계좌 덕에 QR 인증을 하니 금세 자전거의 잠금장치가 풀렸다. 전기 자전거의 페달을 밟자 가볍게 속력이 붙었다.
그렇게 30분 정도 달려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해 휴대폰으로 운행 종료 버튼을 누르고 잠금장치를 채우자, 3천원(기본 15분 1천500원+ 추가 1분에 100원씩)이 찍혔다. 같은 거리로 안산시가 운영하던 공공 공유자전거 '페달로'를 탔다면 1시간에 1천원만 지불했을 것이다. 만약 1시간을 다 채워 자전거를 이용했다면 6천원이 나왔을 것을 생각하니, 가격 차이가 실감이 났다.
안산시민 서원일(32)씨는 "페달로 사업 초부터 정기권을 끊어 애용했다"며 "부담이 적어 버스를 타기 애매한 거리에 (페달로가) 적격이었는데 없어진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안산시, 고양시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오는 12월31일에 '페달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고, 고양시는 이미 이달 1일부터 '피프틴' 사업을 종료했다. 안산 페달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2017년 기준 1천755대를 운영하며 시민의 '발'로 기능했다. 2010년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고양 피프틴은 사업 초기 자전거 정거장만 140곳에 달했고 자전거 3천대를 운영할 만큼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두 지자체 모두 자전거의 노후화 등으로 점차 운행 대수를 줄였고, 적자를 거듭하다 급기야 올해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매년 10억에서 13억의 적자가 나온다"며 "거듭되는 적자가 사업을 접은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표면적으로 사업 주체와의 계약종료를 피프틴 철수의 이유라 밝혔지만, 매년 20억 가량 소요되는 시 지원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공자전거의 갑작스런 철수에 시민들은 안타까워했다. 고양에 사는 강유진(29)씨는 "호수공원에서 피프틴을 자주 탔는데, 갑자기 사라져 당황스럽다"고 했다. 피프틴 대신 민간 공유자전거 '타조(TAZO)'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강씨는 "가격 차이가 있어 쉽사리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조는 1시간 기준 1천300원으로, 500원인 피프틴에 비해 800원 더 비싸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사업 철수를 두고 수익성에 매몰된 단편적인 결정이라고 꼬집으면서 민간 자전거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면 시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공공형 공유자전거가 버스, 지하철처럼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인식됐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 사례에서도 잘 볼 수 있다.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자전거 대수를 오히려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도내 지자체들이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철수 하는 것과 배치되는 행보다. 서울시 역시 적자가 누적됐지만, 시민들의 '건강권'과 '교통 복지'를 위해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90% 이상 만족하는 공공사업이 따릉이 외엔 드물다"며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교통 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다.
류재영 항공대 교수는 안산과 고양시의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해 "공공공유자전거의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많았는데,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접는 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공 공유자전거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자체의 철수 결정을 비판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라스트 마일 교통수단'의 대표격인 공유자전거의 '간접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 분야에서 라스트 마일은 걷기에는 멀지만, 버스 전철로는 연결이 어렵고, 그렇다고 차량을 이용하기엔 마땅찮은 애매한 거리를 말한다.
지하철이 동네 곳곳에 설치된 서울보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경기도에서 라스트마일은 오래된 숙제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활용에 강점을 가진 플랫폼 기업들이 도심 곳곳에 찍힌 자전거의 행로 데이터를 지역 공동체 발전에 접목시킨다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따릉이 등 공공자전거가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데이터로 입증됐다"며 "민간 자전거의 동선 데이터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도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쌓이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