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은색 중형 세단에서 중년 남성 3명이 내렸다. 안전화와 안전모를 쓴 모습이 차량과 이질적이다. 턱 끈을 단단히 조여 매고 발걸음을 옮긴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가 떴다. 고양시장 명의의 신분증을 목에 걸고 가슴엔 이름이 쓰인 명찰을 달았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고양시 덕양구 지축지구의 5층짜리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이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주 1회씩 찾아 안전 지도점검을 한 곳이었다. 지킴이들의 등장이 익숙한 듯 현장 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따라 붙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경계의 눈초리를 보낸다.
30년 넘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건설사에서 일하다 지난 4월 노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된 박현철(58)씨와 서울교통공사에서 37년간 재직하다 지난해 퇴직한 이진영(61)씨가 매의 눈으로 안전 저해 요소를 훑었다.
건설 노동자가 오르내리는 계단에 간이 난간이 없었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승강구에 추락방지망이 없어 자칫 잘못 발을 헛디뎠다간 10여m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아 아찔했다.
안전모 안 쓰고 작업하는 이도
비계 틈 규정보다 두배 넓기도
1시간여 흙먼지 날리는 작업 현장에서 지킴이들이 수도 없이 반복한 말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시정하세요"였다. 두 손을 단전 즈음에 모은 현장소장들은 지킴이들의 지적에 수긍하기도 하고 때로는 항변을 늘어놓았다.
10월 준공을 앞두고 철근을 얽는 작업이 한창이었던 현장의 옥상 층인 5층에 오르자 노동자 예닐곱 명이 보였다. 이곳의 철근공들은 모두 안전모는 착용했으나 현수막 '떨어지면 죽습니다'가 무색하게 건너편 현장 옥상 작업자들은 더러 맨머리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건설현장에선 떨어짐(추락) 재해 방지가 최우선이다. 안전모와 안전대(몸에 착용하는 띠) 등 개인 추락 방지 보호구만큼 중요한 것이 골조 공사를 하는 동안 건물을 둘러 설치하는 비계다.
비계와 건물 사이의 틈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한다. 규정은 30㎝지만, 지킴이 박현철씨가 줄자로 잰 건물과 비계 사이의 틈은 65㎝였다. 성인 남성 2명은 족히 빠질 만한 '죽음의 크레바스'(crevasse·골짜기 균열)다.
'삼풍' 공사 기사였던 박현철씨
"사명감으로 소규모 현장 예방"
노동안전지킴이는 최소한 지켜야 할 규정조차 쉽게 무시되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피땀을 지킨다. 사법 권한은 없다. 다녀간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장대리인을 계도하는 역할이 최선이다. 그래서 지킴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안전계몽운동'이라고 한다.
박현철씨는 대학 졸업 후 서울 삼풍백화점 공사 막바지인 1989~1991년 막내 기사로 현장을 누볐다. 자신이 관여한 건물이 무너져 숱한 목숨이 사라지자 은퇴 이후엔 산업안전 분야에 종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박씨는 "시공사는 유지보수팀에 시설물을 넘겨줄 때 서명을 하는데, 그때 내 서명도 들어 있어 조사를 받았다"며 "삼풍백화점 붕괴는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곪아 터진 사건이었다. 앞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감독관들의 손이 닿지 않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 다니며 재해예방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역 104명 확대 운영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0개 지역에서 10명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해 시범 사업을 한 뒤 올해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 104명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맡은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손용선 센터장은 "시범 사업에서 노동안전지킴이들이 둘러본 현장에서 단 한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도 전역으로 확대됐다"며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 관리자들이 지킴이들의 안전 컨설팅에 대해 호응도와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라고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경기도와의 협력사업으로 선발된 열정적인 4명의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이 일선 산업현장에서 큰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노동 현장을 찾아가 노동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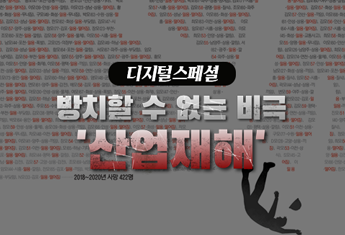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