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시민들이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는건 그만큼 우리네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증거일지 모르겠다. 밥 한 끼에 만원은 심심찮게 넘고 각종 공공요금도 급격하게 올랐다. 지갑에서 나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요량으로 영하 5도의 추운 날씨 속에 전통시장을 찾았을 텐데, 예상보다 높은 가격표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았을 터다.
취재를 마치고 시장 밖으로 나서니 이번엔 각 정당이 거리에 내건 현수막들이 시선을 끌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도 보였지만, 상대 정당을 속된 말로 '디스'하는 내용에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명절이 다가오면 민심의 밥상 위에 오를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벌어지는 '장외 신경전'이 마냥 낯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마스크 넘어 입김과 함께 섞여 나오는 시민들의 한숨을 마주한 뒤 바라본 거리의 풍경은 잔뜩 찌푸린 날씨만큼이나 잿빛이었다.
20여 년 전 대선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말했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가 떠올랐다. 그가 이 질문을 던진 건 '우리 정치가 민생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에둘러 주장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때나 지금이나 민생이라는 단어가 쉴 새 없이 거론되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별반 다를 건 없어 보인다. '무능한 정부 여당 규탄'과 '당 대표 방탄'이라는 지루한 공방 속에 늘어가는 건 시민들의 한탄뿐이다. 올해는 더 암울할 것이란 경제 전망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설에는 우리 정치권이 삿대질을 내려놓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시간을 활용하길 권한다. 아무도 모르게 시장을 둘러보는 것도 퍽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한달수 인천본사 경제산업부 기자 dal@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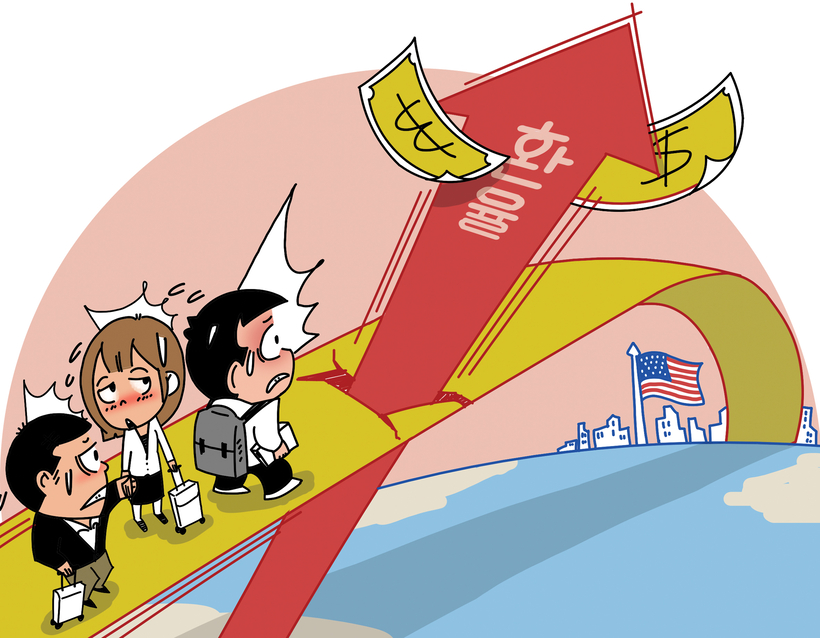









지금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