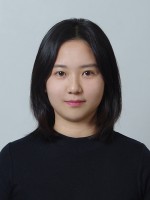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의 노동환경을 취재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최소한의 정원을 두고 최대한으로 일을 시키는 건 "힘들면 다른 곳에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일하는 일반적인 일터의 모습이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 '상시모집'이 관행이 된 곳, 사람이 수시로 바뀌는 곳, 숙련자는 별로 없고 새로 들어온 사람만 많은 곳, 몸을 바쁘게 움직여야 해 다치기 쉽고 미미한 직급차이 사이로 갈등이 싹트기 쉬운 곳.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360명을 증원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만명이 넘는 전체 정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치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정원을 350명 늘렸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와 인천의 지역 규모의 차이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개선 의지를 되묻기도 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급식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배치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뻔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노동문제의 대안이 '인원 충원'으로 귀결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체자를 알음알음 구해야 한다는 한 조리실무사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아픈데도 대체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출근했다가 오후가 돼서야 병원에 갔던 건 나에게도 남아있는 기억이기 때문이다. 적정한 휴가사용과 적절한 노동강도를 위해 정원을 늘리는 것. 진부한 해답이다.
/목은수 사회부 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