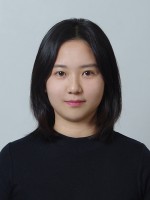도는 이 사건을 수행기관의 '탈락'이라고 부른다. 공모사업 특성상 정해진 티오(TO) 보다 지원기관이 많아 몇몇 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단체는 이를 '해고'라 부른다. 그리곤 비장애인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회계부정 등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 사이에서 기자인 나는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 골몰한다. '일반시민'을 독자로 상정해야 한다는 저널리즘의 원칙은 생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곤 한다. 한참을 고민하다 나의 어휘력을 탓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면 한숨을 쉬곤 했다. 그리곤 되뇌었다. "제대로 못 쓸 바에 그냥 쓰지를 말자."
그런데 해결의 실마리는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 탈락한 수행기관을 찾으면서다.
혜영씨는 50여년 만에 첫 직장을 얻었다. 마스크를 만드는 단순노동 일자리도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며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어느 순간 구직 자체를 포기했던 혜영씨에게 이곳은 자신의 장애를 이해하고 세상이 넓어지는 통로였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그냥 저에게 장애가 있다고만 생각했지, 최중증 장애인이라는 개념도 몰랐어요. 여기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나의 장애를 이해하게 됐고 비로소 우물 밖으로 나온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자부심의 기반에는 센터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을 들 수 있는 직장이라는 사실이 있었다. 센터 탈락이 혜영씨에게 해고가 되는 이유였다.
그제야 기자의 일은 단어를 고르는 것보다 단어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탈락과 해고 모두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일 테다. 중요한 건 단어의 의미는 머릿속이 아닌 만남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목은수 사회부 기자 wood@kyeongin.com